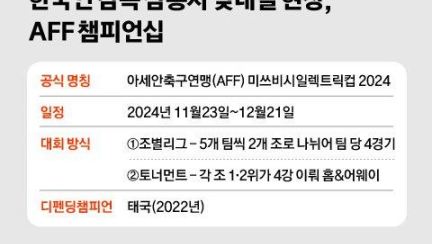남한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이 1993년 8월 당시 생존해 있던 김일성을 직접 만나 ‘접견교시(接見敎示)’를 받고 18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은 충격이다. 왕재산 조직원 중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훈장도 탔다. ‘남조선 혁명’을 꾀한 고정간첩이 20년 가까이 활개를 쳤고,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의장의 비서관이 간첩이라니 기가 막힌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간첩도 있다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검찰은 어제 왕재산 간첩단 5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80년대 주사파로 활동한 총책은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죽음을 불사한 혁명 투쟁’을 다짐하는 충성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는 2001년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을 규합해 왕재산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정치·군사 자료,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직원들은 국회의장 비서관을 중심으로 정치권 침투를 시도했고, 예비역 장성과 장교를 포섭 대상에 넣었다는 수사 내용은 주목을 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에게 손을 뻗치기 위해 ‘상층 통일전선’을 펴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공안 당국은 해석한다. 독일 통일 전까지 동독이 서독에 3만여 명의 고정간첩을 심어놓고 정치인과 관료, 대학생까지 포섭(包攝)한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왕재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요즘은 진보·친북(親北)·종북(從北) 세력이 마구 뒤섞여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칠한 종북세력들이 사회 가치관과 질서를 뒤흔드는 세상이다. 왕재산 간첩이 “국보법 폐지 촛불집회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주도했다”며 북한에 보고했다는 점은 그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실상의 간첩이 암약 중이라는 가설을 통째로 부정할 수 없다. 분단 상황에서 간첩은 엄연한 현실이다. 낡은 레코드판 튼다며 매도하는 그릇된 사회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