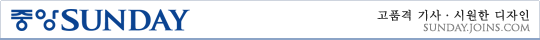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뉴SK’의 상징
윤 상무가 SK텔레콤의 최연소 임원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은 2004년 3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으로 어수선한 때다. 당시 SK 그룹과 최태원 회장에게는 무엇보다 변화가 절실했다. 소버린의 파상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여론과 주주의 지지를 얻는 게 필수였다. 최 회장은 경영진의 세대교체 카드를 꺼냈다. 새로운 SK의 이미지를 심는 동시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까지 노렸다. 그 결과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의 주축을 이루던 경영진은 물러나고 젊고 해외경험이 풍부한 경영진이 전면에 대거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윤 상무의 발탁이었다.
윤 상무는 SK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다. 특유의 고속 행진 때문이다. 그는 서울 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미국 MIT 미디어랩(공학·예술·인문을 융합해 연구하는 교육기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4년2개월이었다. 또 KAIST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까지 높았다. 2004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SK도 그의 이 같은 스타성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각종 행사의 단골 강연자로 나섰다. 최 회장의 대외활동에 동행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업계에서 “홍보효과가 크긴 했지만 과도하게 외부로 노출시킨 게 결국 독이 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임원은 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윤 상무의 본업은 따로 있었다.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SK텔레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다. 그러자면 음성통화 위주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관건이었다.
2005년 사업본부장으로 다시 한 단계 올라선 윤 상무는 2년여간의 준비 끝에 ‘1㎜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용자와 휴대전화 사이의 거리를 1mm 거리 같이 가깝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즉 윤 상무의 전공분야인 인공지능을 적용해 휴대전화 속의 캐릭터가 사용자의 사용패턴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획기적인 서비스였다.
당시 윤 상무는 이 서비스를 “PC 사용 환경이 도스에서 윈도 시스템으로 바뀐 것과 같은 혁명”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PC에 윈도가 도입되면서 마우스만으로 PC를 사용하게 됐듯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보다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의 개발과 마케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가입자 수는 22만 명에 그쳤다.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수의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급기야 매월 1200원을 받던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시켰지만 그마저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조용히 사라졌다. 윤 상무로선 첫 사업부터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이 드는 실패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너무 앞서 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대와 달리 낯선 서비스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싼 무선 콘텐트 이용료도 큰 걸림돌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시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인”이라고 말했다. 발상만 참신하면 인정을 받는 학계와는 달리 기업에선 수익으로 연결될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1㎜ 같은 서비스는 시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며 “기술·문화·시장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송이의 실패’를 기업 내부 구조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와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핵심 임무”라며 “그런 면에서 젊은 여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연공서열의 문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외부 영입이 활성화되면서 ‘30대 임원’이 드물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이들에 대한 조직 내 거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수십 년을 헌신해 겨우 임원 달았더니 새파란 친구가 와서 맞먹으려 한다는 불평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글로벌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기업들로선 외부 영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들의 성공 사례도 잇따라 들려온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임원은 결국 실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경영자에 의해 발탁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2000년 미 MIT 미디어랩 박사 취득
맥킨지앤컴퍼니 서울 사무소
2002년 와이더댄닷컴 이사
2004년 SK텔레콤 TF팀 상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05년 SK텔레콤 CI사업본부장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 선정 ‘차세대 지도자’ 선정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