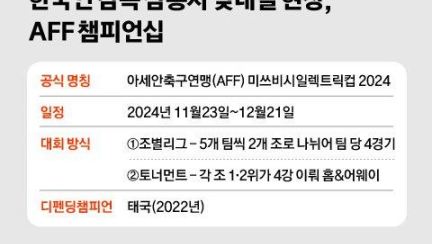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지검에서는 이 나라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마잉주(馬英九) 총통,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 등 국가 최고위층 3명이 같은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는 국회 도청 의혹이었다. 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의 통화를 검찰이 도청했고, 이 내용을 그의 정적(政敵)인 마 총통에게 몰래 보고했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다. 장 행정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번 사건은 마잉주 정권의 공작정치 의혹으로 번져 대만 정국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극도의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마 총통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가 총통관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권 불법 도청 사건은 일단 발생하면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다. 한국에서도 2년 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2011년 6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이라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누군가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연히 야당은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용의자로 몰렸던 방송사 기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채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사건은 땅에 묻혔지만 성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국회가 불법 도청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는 물론 모든 주요 공공기관에 도청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 뒤 국회 사무처는 올해부터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짰다. 새로 짓는 다른 정부 청사에서도 도청방지 대책이 세워졌다.
공개입찰 딜레마 … 국가인증 장비 배제
물샐틈없이 추진하겠다던 공공기관의 도청방지 대책은 대부분 흐지부지됐거나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먼저 논란에 불을 붙였던 국회에선 도청방지 계획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6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뒤 올해 6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본관에는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에만 최첨단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일단 국회의장단과 사무총장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등에도 이런 장비를 달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여야의 의견일치로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여겨지던 이 계획은 지난 6월 의외의 암초를 만난다.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실시한 입찰이 유찰된 탓이다. 입찰경쟁에 들어온 회사는 두 곳이었다. 이들 업체가 떨어진 데 대해 서울지방조달청은 “기술 및 가격 등 종합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도청방지 기술이 수준 미달이었다는 얘기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는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예산을 불용(不用)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회 사무처 예산에도 관련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도청방지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나온 기계들은 확실한 장비가 아니어서 계획을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적잖은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의 도입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능이 뛰어난 장비들이 있음에도 이 기계들이 사실상 도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국가승인 장비는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성능 면에서 민간업체 제품을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국가승인 장비는 기술유출 위험 때문에 민간 판매가 금지돼 있다. 국가기관 전용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탓에 이들 장비는 상세한 기술이 노출되지 않는 수의계약 또는 비공개 입찰로만 도입하도록 돼있다.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면 사실상 국가승인 장비를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공개입찰을 강행한 국회 사무처의 조치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수의계약의 단점, 즉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국회 내규에는 2000만원 이하 사업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공개적인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의계약은 곤란하다는 게 국회 사무처 측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유가 어떻든 국회를 마냥 도청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성능 위주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공개입찰보다는 중앙전파관리소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해 검증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탐지 실험 30번 했더니 11번이나 실패
세종시 정부청사에선 부실한 도청탐지 장치가 설치돼 말썽이 났다. 세종 청사는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총리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에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했다. 이 설비는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민간업체의 제품이어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시에도 지적이 나왔다. 탐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너무 좁아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非)승인 제품을 쓰게 됐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협회, 그리고 관련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실험을 한 결과 총리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의 도청탐지 기능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파수를 달리한 30번의 탐지 실험 중 11번이나 도청 시도를 감지해 내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전파를 탐지해 내는 시간도 30초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에도 미달해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신청사도 세종 청사와 비슷한 케이스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8월 신청사에 도청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승인을 거치지 않은 장비인 데다 외부 도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국회 사무처 의뢰로 실시된 경쟁입찰 당시 기술 미달로 떨어진 제품들이 세종 청사와 서울시 신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실책이 빚어진 이유는 뭘까. 세종 청사 관리를 맡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가 도청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국가인증을 거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규정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이지만 보안의 중요성에 비춰 제대로 된 성능의 장비를 갖추는 게 마땅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투입해 국가기관 전용 도청탐지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해 왔으며 많은 정부 기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남정호 국제선임기자 nam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