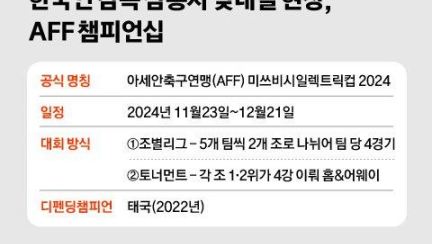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드디어 해냈다.”
박지은이 마침내 LPGA에서 첫 우승을 거둔 배후에는 두명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항상 박의 뒤를 쫓아 다니며 성원하고 스폰서 문제 등 경기장 밖의 일을 돌봐주는 아버지 박수남씨, 그리고 박과 함께 골프백을 메고 실제 필드를 누비는 캐디, 콜린 칸(32)이 당사자들이다.
영국인으로서 지난해 8월 박지은이 프로로 전향하자 직접 찾아와 캐디를 자청한 콜린 칸은 본래 LPGA의 간판선수인 아니카 소렌스탐의 캐디였다.
비록 지난 98년 소렌스탐이 한참 부진에 빠졌을 때 ‘만만한게 캐디’라고 해고당하긴 했지만 94년부터 소렌스탐과 함께 15차례나 정상에 오른 그였다.
22살때 ‘플레이어의 그림자’의 길에 들어서 어느새 10년 경력을 쌓은, 캐디중 정상급인 칸이 박의 가방을 들겠다고 먼저 나섰을 때부터 박지은의 가능성은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칸은 올해 LPGA무대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박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진을 거듭할 때도 전혀 실망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다. 선수의 성적과 상금에 따라 자신의 수입이 달라지는 캐디로서 당연히 초조해야할 그였지만 오히려 박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파워가 실린 장타와 목표의식이 확실한 그레이스(박지은의 미국 이름)가 LPGA의 큰별이 될 것이 분명해 체면불구하고 가방을 맡겨달라고 했다”는 그는 평소에도 “우리는 이미 퓨처스투어에서 5승을 거뒀다”고 자신만만해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반석같은 신념이 현실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칸은 물론 박지은의 첫승에 만족해하지는 않는다. “드디어 LPGA에서도 첫 우승을 차지했다”고 기뻐하면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앞으로 거듭될 박의 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소렌스탐과 함께 지난 96년과 97년 한국에서 열렸던 삼성 월드챔피언십 출전해 한국 문화와 음식에도 친숙한 그는 “한번 불붙으면 무섭게 가속도가 붙는 그레이스를 주목해달라”고 주문하며 “새천년 새롭게 골프역사를 함께 쓰는 명콤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