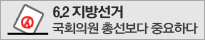 ‘세금 썩는 냄새’가 짙다. 우리 세금의 절반 이상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범이다. 쓸데없는 곳에 도로를 내는가 하면, 한적한 다리 밑에 분수대를 세운다. 곳간은 비었는데 초호화판 청사를 짓기도 한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지자체장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무관심 탓에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는 세금 정치”라며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세금을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난해 말 두문동재 고갯길(국도 38호선) 인근에 10억원을 들여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했다. ‘용연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용연관광지 조성공사는 2001년 민간 사업자가 착공했다가 경영난으로 10년째 방치된 사업이다. 골조 공사만 진행된 건물 4개만 흉물스럽게 서 있을 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사업자가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혀 기반 시설을 닦아준 것인데 이후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썩는 냄새’가 짙다. 우리 세금의 절반 이상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범이다. 쓸데없는 곳에 도로를 내는가 하면, 한적한 다리 밑에 분수대를 세운다. 곳간은 비었는데 초호화판 청사를 짓기도 한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지자체장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무관심 탓에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는 세금 정치”라며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세금을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난해 말 두문동재 고갯길(국도 38호선) 인근에 10억원을 들여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했다. ‘용연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용연관광지 조성공사는 2001년 민간 사업자가 착공했다가 경영난으로 10년째 방치된 사업이다. 골조 공사만 진행된 건물 4개만 흉물스럽게 서 있을 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사업자가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혀 기반 시설을 닦아준 것인데 이후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의회 결정 위반이다. 태백시 의회는 “공사 재개가 확인돼야 기반시설 조성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민간업자로부터 공사 재개 의사만 확인했을 뿐이다. 삽질 하나 재개되지도 않았다. 명백한 세금 낭비다. 태백시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다.
강원도 고성의 DMZ 박물관 건축에는 국비와 도비 450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박물관은 현재 매달 수억원씩 적자다. 140억원이 들어간 부속건물 다목적센터는 건립 이후 단 한 차례만 대관됐다. 수입은 모두 25만원. 사업 초 수요 예측을 과장되게 한 탓이다. 당초 타당성 보고서에는 2011년께 DMZ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하루 1만1496∼1만352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5개월간 실제 관람객은 하루 350∼550명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전망치가 들어맞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자체들은 생색 안 나는 복지사업 대신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사업에 세금을 펑펑 쓰기도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재정자립도는 32.8%다. 전국 평균(53.6%)보다 낮다. 그런데도 유성구는 3년째 ‘5월의 눈꽃 축제’에 큰돈을 쓴다. 유성구는 올 초부터 ‘소녀시대가 옵니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올해 본 축제 예산만 4억8000만원으로, 지난해(2억6000만원)보다 배 가까이 늘렸다. 천안함 사태로 공연 일부가 취소됐지만 홍보비 등 예산 대부분이 이미 집행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937개 축제에 2300여억원의 세금을 썼다. 이 축제 가운데 728개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듬해인 1996년에 새로 생겼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소개·판매할 뿐 아니라 치적 홍보도 할 수 있어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수만 많을 뿐 함량은 떨어진다는 점.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열린 축제 115건 중 3년 평균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A급 축제는 13개(11%)에 불과했다. 반면 1만 명 이하인 C급 축제가 63개로, 절반 이상이다. 그런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203건의 축제가 열린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지자체들은 호화청사를 잇따라 짓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준공된 지자체 청사만 18곳. 총 1조3507억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문화·체육시설 설치비용 역시 2006년 5484억원에서 지난해 1조412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재정 건전화에 힘을 쏟는 지자체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심성 사업은 곧바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세금 낭비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탐사 1·2팀=김시래·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사진=조용철·강정현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