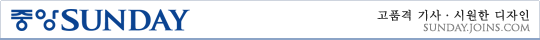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드디어 ‘20K 이정표’가 눈앞에 왔다.”
요즘 인도 경제신문을 보면 이런 말로 들썩인다. 주가가 곧 ‘2만 포인트’(K는 1000) 봉우리를 뚫을 것이란 환호다. 연초 1만3000대에서 출발한 주가는 큰 굴곡 없이 고도를 높여 40% 상승했다. 장중으로는 이미 지난달 19일 2만 포인트를 돌파해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132년 역사의, 아시아 최고(最古) 이력을 자랑하는 뭄바이 증시지만 요즘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보기 드물었다.
당연히 펀드 수익률도 꿀맛이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펀드로는 미래에셋의 ‘인디아 디스커버리’가 연초 이후 46% 수익을 냈다. 역외펀드 중에선 5000억원가량 팔려나간 피델리티의 ‘인디아 포커스’가 수익률 43%를 기록했다.
사실 이런 성과는 인도인들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루피화(貨)의 강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증시 성적표가 변변치 않을 것으로 봤었다. 그러나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12조원을 인도 증시에 퍼부었다. 그중 3분의 1이 9월에 들어왔다. 어두워지는 경기전망 속에서 중국과 더불어 인도를 유력한 성장엔진으로 봤다는 평가다.
주가가 꽤 올랐지만 아직 낙관론자들은 많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아룬 메흐라 펀드매니저는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인 9%대의 높은 성장을 구가한다”며 “여기에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경제 악재인 물가 상승과 대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탄탄한 기본 체력과 균형 잡힌 식단이 주가의 키를 훌쩍 높였다는 얘기다.
피델리티는 인도 기업 중 ▶중산층 증가의 덕을 보는 소비업체 힌두스탄 유니레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소프트업체의 선구자 인포시스 ▶에너지·화학 그룹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같은 기업에 집중 투자해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내수ㆍ정보기술(IT)ㆍ대기업이 고루 성장해 가는 인도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긍정적 논리는 더 있다. 우선 경제성장을 뜀틀 삼아 기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인도 루피화(貨)의 지속적 평가절상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 물건의 가격이 올라 수출주에는 다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수입가격 감소로 내수 소비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둔화 조짐을 보이는 미국 경기도 인도의 장기인 아웃소싱 산업의 수주를 늘려 득이 된다는 평가다.
■ 몸값은 26배
그렇다면 지금 인도 펀드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것일까? 현지에서도 거품에 대한 경계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주가가 ‘더블’이 됐으니 과속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가늠하는 잣대인 주가수익비율(PER)을 보면 겁이 날 만도 하다. 지난해 2월에 19배였던 PER는 지금 26배가 됐다. 2000년대 초의 ‘닷컴 거품’ 이후 최고 수준이다. PER가 100배를 넘는 종목도 100개에 이르며 아예 ‘100 클럽’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예컨대 릴라이언스 내추럴 리소시스(RNRL)라는 에너지 회사는 한 달 만에 주가가 85% 급등하면서 PER가 621배로 높아졌을 정도다. 인도 ICICI 다이렉트의 하렌드라 쿠마르 리서치센터장은 “PER가 높은 건 장래 성장가치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며 “이익이 증가하면서 PER도 이성적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싸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 상하이 증시의 PER는 56배에 이른다. 인도의 2배 몸값이다. 선진국 증시인 홍콩(20배)과 비교해도 인도가 과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구재상 대표는 “최근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려 하자 주가가 급락했다”며 “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인도 정부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해석이다. 인도 IDBI 캐피털의 샤히나 무카담 리서치센터장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비싼 수준에 이르렀으나 경제의 장기 성장세를 감안하면 지금 현금으로 바꾸라고 권할 순 없다”고 말했다.
■ ‘용과 코끼리’의 교훈
이처럼 과열 논란이 심할 만큼 올해 인도 펀드는 빛을 냈지만 자금 유입은 더뎠다. 중국 펀드에 가린 탓이다. 국내의 인도 펀드의 설정액은 지난해 말 6000억원에서 현재 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이 됐다. 그러나 중국 펀드는 같은 기간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5배 폭발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여러모로 용호상박이다. 11억과 14억의 인구, 세계 7위와 4위의 땅덩이, 인더스와 황하 문명을 일으킨 자부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국, 뒤늦게 시장경제에 목을 매는 나라….
그러나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시장경제를 품고서 질주했다면 인도는 1990년대 초에야 레이스에 동참했다. 인도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들은 “지금은 느리지만, 급하게 먹다 배탈 날 중국을 결국 추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증시 흐름을 돌아봐도 이런 교훈을 얻는다. 중국은 성장세처럼 주가도 급하다. 상하이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에 앞서 2003년부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3년 수익률을 봐도 그렇다. HSBC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 펀드의 3년 수익률은 316%다. 인도도 280%로 크게 뒤지지 않는다. 다만 올 들어 수익률은 중국이 인도보다 두 배 정도 높다. 이는 거꾸로 보면 앞으로 인도펀드의 상승 잠재력이 더 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인도와 중국이 결국 어깨를 겨루며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양 기둥이라는 사실이다. 두 시장에 동시에 투자하는 친디아 펀드도 대안이 될 만하다는 소리다. 미래에셋의 친디아펀드는 중국에 66%, 인도에 33%가량을 투자한다. 올해 수익률은 83%에 이른다.
김준술 기자
[J-HOT] "명문대 떨어져 재수 하느니 편입 생각할 정도"
[J-HOT] 조영남“어머니는 예수만…난 국산품이 안쓰러워”
[J-HOT] 최병렬 "昌 출마하면 이·이 둘 다 떨어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