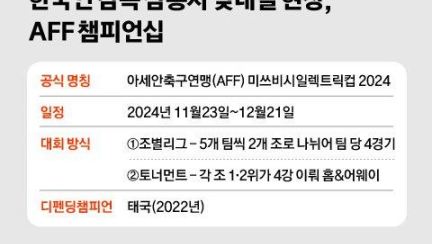바람 잘 날 없다는 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16년째 이어져 온 서울패션위크에 또다시 잡음이 생겼다. 디자이너 단체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이하 연합회)가 10월 열리는 추계 컬렉션에 불참을 선언한 것. 주최 측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참가자격과 요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또 그 내용 역시 일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스타일#: 디자이너 단체의 단체행동
지난 5월 재단 측은 정구호 휠라코리아 부사장을 예술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 ‘혁신’을 단행했다. 행사 규모와 예산을 반영해 참가비를 250만 원에서 700만 원(700석 기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1000석 기준)으로 각각 올렸다. 참가자격 역시 ‘사업자 대표 또는 공동 대표인 디자이너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제출 서류에는 매장 임대계약서와 PR 실적이라는 항목도 신설됐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조율 없는 서울시의 불통” “관의 갑질”이라며 비난했고, 행사 보이콧을 발표했다. 국내 대표 패션 행사에 디자이너들이 나오지 않겠다는 메가톤급 선포였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며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디자이너들의 불참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서다. 잠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서울패션위크(옛 서울컬렉션)는 태생 자체가 디자이너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뤄졌다. 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SFFA), 뉴웨이브인서울(NWS),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KFDA)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1990년부터 자체 컬렉션을 해오던 SFFA가 서울시의 패션산업육성책에 호응, 서울패션위크에 통합됨으로써 지금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허나 이후 꾸준히 디자이너 그룹과 서울시의 주도권 싸움이 반복됐다. 관 주도의 컬렉션, 디자이너 선발 기준 말고도 총괄 기획사의 선정 주체나 행사장의 획일화 논란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때마다 각 디자이너 회원 단체들은 참가와 불참을 반복했다. 일례로 SFFA는 2007년 추계 행사에 불참하고 독자적인 컬렉션을 열었지만 2008년 춘계 때 복귀했다. 2010년 추계 때는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행사를 보름 앞두고 다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요, 따로 또 같이의 도돌이표였다.
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재단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고, 서울패션위크와 별도의 컬렉션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데 한 가지가 달라졌다. 단체의 결속력이다. 연합회의 입장과 달리 디자이너 일부는 재단 요구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정미선 디자이너는 패션위크가 각자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세계무대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이 맞다면 따를 용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미 참가 신청을 마친 이들도 상당수였다. 재단 측은 기성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서울컬렉션의 경우 40명 정원에 53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기자회견장에 나온 원로 디자이너 일부도 포함됐다.
세상사라는 게 늘 한목소리일 수는 없다. 뜻이 맞지 않아 각자의 길을 걷는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미래를 위해 발전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이라면 말이다. 지금껏 디자이너 단체는 불참과 참가를 반복하며 과연 무엇을 얻어냈을까. 무엇보다 내부 목소리도 통일되지 못한 채 이뤄진 불참 선언은 어떤 명분일까. 단체의 단체 행동으로 보기에는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또 민망하다.
글 이도은 기자dangd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