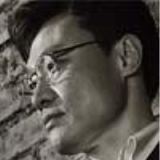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1980년 서울 세운상가 3층. 학교에서 ‘빨간책’ 공급책으로 명성을 날리던 친구에게 이끌려 그곳에 당도했다. 좁은 골목에는 수상한 젊음, 수십 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친구가 한 가게 앞에 서자, 종업원이 반쯤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다. 이윽고 둘 간에 암구호가 오갔다.
가게 종업원 : 태극기!
친구 : 만세!
종업원은 확실한 사람의 소개로 왔다는 믿음이 서자 우리를 가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짧고 굵은 거래 끝에 우리는 ‘펜트’ 최신호를 품에 넣을 수 있었다. ‘탱크 말고는 다 만든다’는 호언이 통할 정도로 세운상가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었다. 빨간책은 무수한 품목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전자부품을 사고팔던 젊은이들이 기업오너·교수·발명가가 됐다. 세운은 창업의 산실이자 해방공간이었다.
34년 후, 다시 그곳에 섰다. 문 닫은 가게가 곳곳에 눈에 띈다. 버린 소파·사무집기도 나뒹군다. 수상한 젊음은 휴거(携擧) 상태다. 한산함을 뒤로하고 최종 방문지인 550호로 향한다. (사)창업지원기관인 ‘타이드 인스티튜트’의 대표, 불운의 우주인 고산(37)씨의 일터다. “찌찌찍, 찌찌찍” 사무실에서는 3D프린터가 소리를 낸다. 플라스틱 인형을 컴퓨터로 스캔해 똑같은 복제인형을 만드는 중이다. 그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창업교육을 해주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부를 하다,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2011년에 귀국해 이곳을 만들었죠. 최신정보 수집, 교육, 창업지원이 저희 일이죠.”
강남 테헤란로가 아닌, 쇠락한 세운에 터를 잡은 까닭을 물었다. “세운은 개발시대의 상징이죠.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즉 창업시대를 여는 것,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가 세운을 택한 것은 역사성 때문만은 아니다. 실질적인 ‘공간성’에 주목했다. “수많은 부품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선진국 벤처는 이런 입지에서 탄생합니다.”
1968년 세워진 세운상가는 당시 최대·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었다. 대표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았다. 40여 년간 영욕을 지켜본 고영균(68·주민회 감사)씨의 회고다. “1~4층은 상가, 5~8층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에는 유명연예인·기업오너가 살았지요. 미군·월남참전용사가 갖고 오는 별별 기기가 넘쳐났고요.”
강남이 개발되고 용산전자상가가 문을 연 80년대 후반부터 세운은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는다. 1990년 초반부터 재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과 연계한 재개발이, 오세훈 시장 때 초고층 건립계획이 세워졌지만 무산됐다. 복잡한 지분, 부동산 경기 침체, 종묘 인접성이 변신을 막았다. 세운상가와 주변 13만 평은 도시의 흉물이 돼 갔다. 박원순 시장 들어 분할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얼마 전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주민 반응은 미지근했다. 수십 년간 시정(市政)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고산씨가 세운에 입주할 때만 해도 주민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그가 꿈꾸는 미래가 자신들의 과거 영광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그는 낙관적이다. “저 같은 사람이 몰려들면 21세기 서울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겠지요.”
‘1인 제조’ 창업의 기수인 미국 ‘테크숍’그룹의 짐 뉴턴 회장이 지난해 여름 서울을 돌아본 적이 있다. 그는 세운의 잠재력에 찬사를 보냈다. 수도 중심부 10만 평이 넘는 땅에, 1000개가 넘는 테크숍이 남아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축복이라는 평가다.
세운의 장래를 정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도심 흉물로 남게 될까. 아니면 창업과 해방의 공간으로 부활할까. ‘핵무기 빼고 다 만든다’는 새로운 전설을 상상하며 옛날 ‘빨간책 골목’을 벗어났다. 상가 앞 공원에는 눈이 잔뜩 쌓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규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