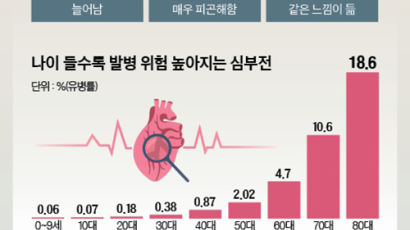프랑스 파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 파리시
지난 7월 말 들른 프랑스 파리 16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은 여름 방학인데도 문을 열었다. 한 달 가까운 프랑스의 방학 기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를 위해서다. 일종의 ‘거점 보육원’인 셈이다. 알록달록한 놀이방과 원목 위주로 꾸민 놀이터, 유아를 위한 물놀이 욕조까지…. 한국의 여느 어린이집과 다를 것 없는 시설이었다.
다만 바닥을 기지 못할 정도로 어린 갓난아기도 많았다. “한국에선 이 정도 어린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다. 프랑스 부모는 불안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린이집 부원장 오드 블린(49)은 “프랑스에선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사회가 함께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부모들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돌봐주기 때문에 갓난아기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선 생후 2개월 지난 갓난아기부터 3세 유아까지 57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보육을 받는다. 급식비를 제외한 수업료는 무료다. 백인부터 흑인·아시아인까지 다양한 인종도 눈에 띄었다. 아이도 그랬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16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방학철을 맞아 통합 보육을 하는 교사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파리=김기환 기자
인터뷰 내내 조화·소통을 강조한 블린 부원장은 “성별과 나이, 인종, 다양한 배경을 차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아 교육의 목표”라며 “1년에 세 번 이상 학부모 대표와 어린이집 교사, 시청 관계자가 만나 어린이집 생활과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해 교육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1.8명을 기록한 프랑스는 유럽·북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위다.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두배 이상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답게 저출산 대책도 열려 있다. 비혼(非婚)·동거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 휴직부터 각종 수당까지 결혼 자녀와 같은 혜택을 준다. 가족의 합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일명 ‘n분의 n승’ 과세 방식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그 결과 비혼을 통한 출산이 60% 이상일 정도로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여긴다.

현재 홀로 18세 아들을 키우는 샤를린 줄리(가운데)가 과거 동거인, 동거인의 자녀와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모습. 독자 제공.
파리에서 만난 비혼 워킹맘 샤를린 줄리(48)는 “나는 두 번 째 동거, 동거인은 세 번 째 동거인데 각각의 자녀 1명씩을 데려와 함께 키운다”며 “동거한 뒤 자녀를 먼저 낳고, 필요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며 자녀를 함께 키우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한국에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을 그대로 이식할 수도 없고, 이식하더라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다양한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복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 휴직, 값싸고 질 좋은 보육 인프라(유치원·어린이집)까지 상당 부분 선진국을 따라잡은 수준의 하드웨어(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환경·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17년 전인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추세가 지속할 경우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과도한 업무 강도 등이 맞물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며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족하고 ‘한국스러운’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운세] 4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