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저마다의 안다 형이 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동네 지식인. 무엇이든 물어보면 모른다 하지 않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 1970년대 부산의 산복도로 동네에도 역시 안다 형이 있었다.
나는 여러 과목에 걸쳐 골고루 공부를 못했지만 특히 수학은 바닥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수업을 따라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점점 어려워지더니 수학시간이 되면 몸이 아팠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다. 나는 안다 형을 찾아갔다. 안다 형은 화투 점을 치고 있었다.
“뭐야. 님이 오신다더니 네가 온 거야? 화투 점, 이거 실망인걸.”
나는 수학이 어렵고 수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안다 형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안다. 네가 수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수를 모르면 안 된다.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모든 것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말한다. 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지만 다르다.”
안다 형은 화투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몇 개냐고 물었다.
“하나.”
“그래. 하나지. 그런데 하나가 뭐냐?”
나는 슬슬 속이 메스꺼워졌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너는 하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랬지. 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는 맨 처음에 나오는 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 좀 상상을 해봐. 지금부터 내가 하나를 가리켜줄 테니 열을 깨우치도록 해.”
나는 ‘가리키다’가 아니라 ‘가르치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안다 형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안다. 가리키는 게 가르치는 거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킨다. 발음도 비슷하지. 하늘을 봐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차고 달이 기울지. 하늘은 시간이다. 그럼 둘은 뭐냐?”
안다 형은 내 대답을 기다린다기보다 그저 잠시 뜸을 들이는 것 같았다.
“둘은 ‘들’을 가리킨다. 들은 곧 땅이다. 하늘이 있으니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땅은 공간이다. 하늘과 땅이 있으니 시공간이 되는 거지. 셋은 뭘까? 하나와 둘을 배웠으니 열은 몰라도 셋은 알아야지.”
“셋은 ‘씨앗’을 가리킨다. 하늘과 땅에서 살아 꿈틀대는 모든 것들. 동물이고 식물이고 인간이고. 씨앗은 생명이지.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다. 그럼 넷은 뭐냐?”
나는 더 이상 내게 묻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했다.
“넷은 ‘낳다’를 가리킨다. 낳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며 운동이고 운명이고 본능이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 생산이지. 다섯은 ‘다스리다’를 가리켜. 다스린다는 게 뭐냐? 생명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살피고 북돋우는 것이지. 그런 게 정치야.”
“여섯은 ‘잇다’를 가리킨다. 전승이고 계승이지. 역사를 알아야 해. 새로운 것도 알고 보면 오래된 옛 것에서 나오는 법이거든. 일곱은 ‘일깨우다’를 가리켜. 교육을 말하는 거지. 이쯤에서 순서를 잘 생각해 봐. 다섯 다음에 여섯이 나오고, 여섯 다음에 일곱이 나오는 순서를.”
“여덟은 ‘열고 닫다’를 가리킨다. 열고 닫는 게 뭐냐? 문이지. 문이 있는 곳이 경계인데, 문에는 벽도 있지만 길이 있지. 문으로 무엇인가 들고 나지. 문물이, 문화가 오가는 거야. ‘열고 닫다’는 소통과 문화다.”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그럴듯했지만 안다 형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었다. 어디서 본 것이지 아니면 혼자 상상으로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홉은 ‘어울리다’를 가리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의 어우러짐, 조화 말이야. 상상해 봐. 이 숫자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으로 열은 뭐냐?”
“그건 좀 알 것 같은데. ‘열다’ 아니야?”
“맞아. 아홉까지 가르치니 비로소 열을 아는 녀석이네. 그래. 열은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을 가리켜. 이상향이지. 씨앗의 열매이고. 하나에서 시작한 숫자 이야기가 열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될 거고.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리켰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자. 삼이 뭐냐?”
“씨앗이라며, 생명이고.”
“셋이 아니고 삼 말이야, 3.”
“아라비아 숫자 3? 모르겠어. 인삼이나 산삼은 아닐 거고.”
“3도 몰라? 3은 나들이다. 밖에 놀러 나가자.”
안다 형은 벚꽃이 그려진 화투를 들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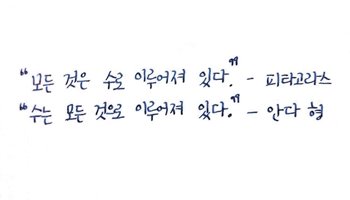
김상득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기획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웃음과 느낌 이 있는 글을 쓰고 싶어한다.『아내를 탐하다』『슈슈』를 썼다.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