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숙씨는 “어렸을 때 오빠들이 책을 많이 빌려왔는데, 마루에 뒹구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작가의 꿈은 그렇게 자랐다.
신경숙씨는 “어렸을 때 오빠들이 책을 많이 빌려왔는데, 마루에 뒹구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작가의 꿈은 그렇게 자랐다.『Please Look After Mom(엄마를 부탁해)』으로 외국에서도 주목받은 신경숙 작가가 두 번째 영문판 장편소설 『I’ll Be Right There(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사진)』를 발간했다. 뉴욕타임스·허핑턴포스트·가디언 등 외신들은 호평했다. 책 발간에 맞춰 뉴욕을 찾은 신씨를 최근 맨해튼에서 만났다.
- (영문판) 표지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본인이 모델인가.
“사람들이 나냐고 묻는데, 아니다.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이 나왔을 때도 표지 여자가 나냐고 묻더니…. 한국에서는 책 표지에 사람 얼굴을 잘 안 넣는데, 미국에선 많이 넣더라.”
- 두 번째 영어 번역 작품으로 『어디선가…』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 에이전시가 원했다. 나는 『외딴방』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이걸로 했으면 했는데…. 『외딴방』은 프랑스·독일·일본·중국 등에선 출간됐다. 영어 번역이 잘 돼야 이를 텍스트로 중역(이중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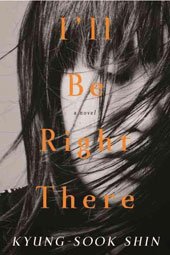
- 『엄마를 부탁해』가 워낙 인기를 얻었다.
“작가 생활이 올해 29년째인데,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출간이)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외에서 내 문학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마치 ‘엄마’를 대변하는 작가처럼 이미지가 굳어가는 느낌이었다. 작가가 특정 작품으로 이미지가 고정되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작가로 있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인, 이번 작품을 쓸 때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했다.”
한국에서 2011년 발간된 『어디선가…』는 8년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보세요”라는 소리에 “어디야”라고 대답한다. 그리곤 이내 ‘어디야’라는 대답 속에 담긴 마음과 추억, 생각을 풀어낸다. 과감한 압축에서 길게 펼치는 확장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이야기는 주인공 네 명의 ‘젊음’ 속으로 조심스레 여행한다.
- 『어디선가…』에 대한 외신 반응이 좋다.
“한국에서는 거의 30년 동안 글을 쓴 중견작가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겨우 두 번째 책을 낸 신인작가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다. 그런 긴장이 좋다. 나를 새로 돌아보게 하고, 좀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시 긴장시킬 수 있고.”
- 특히 어떤 면이 긴장되나.
“일단 내가 내 작품을, 내가 쓴 작품인데도, 읽을 수가 없다. 영어는 덜하지만 불어·독어·스페인어 이런 말들은 내가 아예 모르니까. 원작자인 내가 이 글이 잘 쓰인 건지 읽을 수 없으니까, 마치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점자 책을 보는 느낌이다. 해독도 못하니 막막하다.”
- 책 배경이 한국 사회인데 외국 독자들이 잘 이해할까.
“물론 문화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 특히 외국 기자들과 만나고 인터뷰를 해 보면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윤 교수’라는 캐릭터에 애정이 많더라. 자기 인생에서 그런 멘토들을 많이 기억나게 해준다고. 여기 등장하는 젊은이 네 명이 비극적인 시대에도 서로 만나서 같이 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꿈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비슷했다. 사실 내가 『엄마를 부탁해』 다음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나랑 같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만나거나 학교에 가서 특강할 때,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안타까워서, 옆에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 본인의 꿈은 처음부터 작가였나.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문학 작품 안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매혹시켰던 것 같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잘난 사람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런 글을 써 봐야겠다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꿈을 이미 이룬 것 같은데.
“꿈을 이루는 순간, 마치 물방울이 솟아나듯 또 다른 꿈이 태어나는 것 같다. 또 새로운 꿈을 꾼다. 처음에는 오로지 내가 살아야 했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빠져들고 몰입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걸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쓰는 작품이 어떤 한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방향으로 흔들어주기를 바란다. 인간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게 되는 출구가 되어주기를. 그게 내 새로운 꿈이다.”
글·사진=뉴욕중앙일보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