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빅슬립’(1946)의 한 장면
영화 ‘빅슬립’(1946)의 한 장면 소설에선 펄펄 날다가도 스크린에선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느적거리는 캐릭터가 가끔 있다. 원작의 묘사가 워낙 강렬해서일까. 레이먼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우도 그렇다.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도 원작처럼 폼 나는 말로우를 볼 수 없다.
남윤호 기자의 추리소설을 쏘다 -필립 말로우 <下>
험프리 보가트, 로버트 미첨, 제임스 가너, 엘리엇 굴드, 로버트 몽고메리, 조지 몽고메리, 딕 파월, 제임스 칸…. 여러 배우가 도전했는데, 그중에서도 하워드 혹스 감독의 ‘빅슬립’(1946)에 나온 보가트가 가장 큰 발자국을 남겼다. 영화도 대성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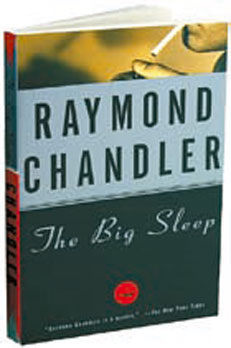
하지만 말로우 팬들의 성에 차진 못했다. 보가트와 말로우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보가트는 어디까지나 보가트였다. 그만의 카리스마가 앞섰다. 그런 인상은 말로우보다 샘 스페이드에 가까웠다.
결정적인 흠이 또 있다. 보가트의 키가 작았다는 거다. 안타깝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작의 대사도 바꿔야 했다. 말로우가 스턴우드 장군의 집에서 골칫덩이 막내딸 카멘과 처음 마주치는 장면을 보자.
원작은 이렇다.
“키가 꽤 크시군요.”
“내 잘못은 아니지.”
서로를 찔러 보는 대화인데, 영화에선 이렇게 바뀌었다.
“키가 생각보다 작으시군요.”
“애는 써봤지만 말이야….”
엇박자로 튕기는 대화의 맛이 확 죽었다.
보가트 이후엔 별 볼일이 없다. 챈들러의 걸작 『기나긴 이별』은 73년 로버트 알트먼 감독이 영화화했는데, 곱슬머리 엘리엇 굴드가 주연이었다. 그 역시 말로우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말로우 팬들은 이 영화와는 이미 기나긴 이별을 했으니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조금 낫다는 게 75년의 ‘안녕 내 사랑’과 78년 리메이크된 ‘빅슬립’의 로버트 미첨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원숙미, 세상이 귀찮다는 표정, 염세적인 말투…. 제법 괜찮았지만, 문제는 나이였다. 57세와 60세 때의 미첨이 박력 있는 30대의 말로우를 소화할 수 있었겠나. 후줄근한 중년남에게 누가 사건을 맡길까 싶을 정도였다. 딕 리처즈(안녕 내 사랑)와 마이클 위너(빅슬립), 두 감독은 “미안하게 됐다, 말로우”라며 사과문이라도 써야 한다.
그럼 챈들러는 말로우 역으로 누구를 점찍었을까. 3대 하드보일드 작가인 대실 해밋, 챈들러, 로스 맥도널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출신의 추리작가 로버트 파커는 이렇게 말했다. “챈들러 자신은 캐리 그랜트가 말로우에 가깝다고 봤다.” 글쎄, 이거 못 들은 걸로 하자. 반질반질하고 로맨틱한 말로우라? 파커도 동의할 수 없다는 듯, 한창 때의 해리슨 포드를 대안으로 꼽았다.
말로우는 다른 영화에서 비유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가 오히려 감칠맛이 난다. 83년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 초반에 나오는 천사 다미엘의 독백. “아, 그거 참 좋겠다. 필립 말로우처럼 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번잡다단한 인간적 일상의 실존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다.
추리소설에 재미 붙인 지 꽤 됐다. 매니어는 아니다. 초보자들에게 그 맛을 보이려는 초보자다. 중앙일보 금융증권데스크.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