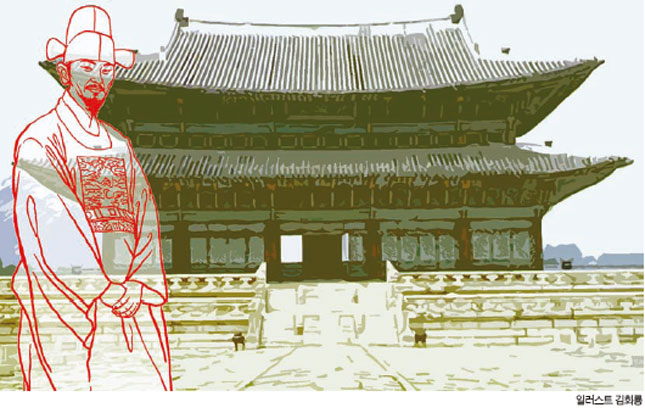
1. 누가 간신인가
바른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선을 풍미한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은 너나없이 간신과 충신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도전의 『경제문감』에도, 이황의 『성학십도』에도, 이이의 『성학집요』에도,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조정 신하들이 왕에게 종종 올리는 정책 건의서인 ‘시무책’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반드시 “간신을 구별하라”는 건의가 들어 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간신과 충신의 구별이 중요한가? 대체 누구를 간신이라 하는가?
조선의 간신들
간신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 한국, 특히 조선의 정치체제가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이다. 명목상 왕은 세상을 다 가지고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같은 군주라 해도 새로운 세금이라도 걷으려면 원로원이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유럽의 왕들과는 다르다. 조선의 법령을 집대성했다는 『경국대전』도 사실 역대 임금이 내린 정책 결정을 편집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무한권한을 가진 왕이었기에 그만큼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도 했다. 왕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왕이 폭군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그래서 왕은 늘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고, 학식 높은 신하들과 토론해야 했으며, 사냥이나 여색, 기타 오락거리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했다.
왕이 ‘나의 고유 권한’을 내세우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땠을까? 법적으로는 신하들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달랐다. 가볍게는 왕이 도무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줄기차게 상소를 올리고(‘귀가 아프도록 떠들면 들어주겠지?’), 무겁게는 너도 나도 벼슬 자리를 내던지고 낙향했다(‘임금 혼자 잘 다스려 보라고 해!’). 그래도 안 되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다(反正)’는 이름을 내건 쿠데타가 터졌다. 무한권한이 곧 무한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조선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허약했다는 것은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왕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도 곁에서 모시는 신하가 사악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간사한 신하가 왕의 마음을 현혹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면 왕은 폭군과 진배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왕은 스스로 인격 수양을 하고 유교적 성인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편 사악한 유혹자, 즉 간신을 주변에서 물리쳐야만 했다. 그러므로 “간신을 구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간신일까? 간신이라고 머리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간신 스스로 “네, 제가 바로 간신입니다”라고 말할 리도 없고··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쓰이던 ‘변간법(辨姦法)’이 유행하기도 했다. 『육도』와 『여씨춘추』에는 ‘팔관법(八觀法)’이 나와 있다. “핵심을 찌르는 말로 그 덕을 살핀다” “돈을 다루는 일을 맡겨 그 청렴함을 살핀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쓰는지 살핀다” “실의나 좌절에 빠졌을 때 그의 지조를 살핀다” 등등이다.
또 『한비자』에는 ‘관청법(觀聽法·언행을 잘 보고 잘 들을 것)’ ‘도언법(倒言法·말을 일부러 뒤집어 해서 반응을 살필 것)’ ‘반찰법(反察法·그 행동의 동기를 뒤집어 생각해 볼 것)’ 등 다섯 가지 ‘찰간술(察奸術)’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런 변간법들은 모호한 구석이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도덕보다는 술수를 앞세우는 법가(法家)의 산물이라 해서 진지한 유학자들은 즐겨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간신의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다 보니, 결국 개인적 원한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간신이라고 모는 일이 숱하게 벌어졌다. 그러면 당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저놈이 진짜 간신이라고 되받아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성향은 더 심해지고, 조직화되어 마침내 당쟁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서인이 통째로 간신배가 되었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 이번에는 남인이 남김없이 간신 소리를 들을 차례였다.
그러면 이처럼 간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평범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간신으로 몰려 벼슬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었으니, 조선조에는 진짜 간신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한명회·유자광·임사홍·남곤·김안로·윤원형···. 조선왕조 500년은 어떻게 보면 간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물급 간신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그 간신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굽이쳐 온 시대였다.
왜 그랬을까? 우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병이 들거나 털갈이를 하거나 하면서 생체 메커니즘이 평소와 달라질 때가 있듯 왕조국가의 메커니즘도 특수해질 때가 있다. 코흘리개가 새로 임금이 되거나, 정변을 통해 임금이 바뀌거나 해서 누군가 새 임금을 밀착 보호하고 보좌해 줄 사람이 필요해지는 때가 그렇다. 한편으로 워낙 간신을 죄악시하는 정치문화다 보니 정쟁에서 패배한 쪽에 간신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과정에서 역사에 간신으로 남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왕조국가가 아닌 현대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원칙은 다르지만 사람 사는 사회, 사람이 만든 조직은 한결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회사 동료를 손가락질하며 “저 인간은 영락없이 간신배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누군가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빌붙어 실력보다는 간사한 술수와 아첨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는 현대판 간신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 조상이 발견했던 진리, 즉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한다. 물론 사람됨에 너무 치중하여 제도적인 틀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말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의 간신을, 또한 우리 가슴속에 숨은 간신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과거의 간신들 이야기를 읽어 보아야 한다.
함규진은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로 현재 성균관대 부설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정약용 정치사상의 재조명』『왕의 투쟁』등의 책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