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엘리베이터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환자가 함께 타고 있을 때는 부딪혀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터라 모두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이때 누군가의 휴대전화기가 울린다. 대개 이런 대화다.
“아, 그래? 지금 이모가 입원해서 병원에 병문안 왔어. 어디라고? 뭐라고? 아, 많이 아픈 건 아니야. 밥은 먹었어? 냉장고 안은 봤어?”
엘리베이터 안에선 말이 잘 안 들리니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꼼짝없이 그 사람의 이모가 입원했고 집에 들어온 아이가 뭘 먹는지 들어야 한다. 이상한 것은 문병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휴대전화 통화를 듣는 것은 짧은 시간임에도 ‘남의 사생활을 왜 알아야하지?’란 짜증이 솟구치는 걸 경험한다. 내가 유난히 까칠한 걸까. 유독 타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흥미로운 실험을 발견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앰버슨은 버스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다. 함께 탄 승객의 휴대전화 대화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져 논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당연 짜증이 났다. 승객에게 “전화를 그만하라”고 쏘아 붙이는 대신 앰버슨은 심리학자답게 그 이유가 궁금해져 연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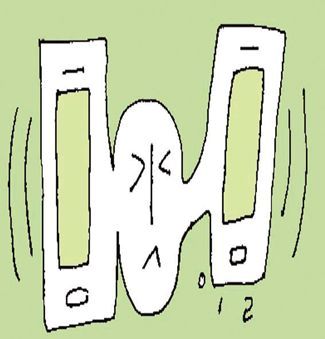 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연구 참여자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점(點)을 마우스로 쫓아가 누르도록 하는 집중력 요구 행동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미리 녹음해둔 반쪽짜리 휴대전화 대화를 들려줬더니 참여자들의 실수가 확연하게 늘어났다.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의가 그 목소리로 옮겨가서 겨우 400 밀리(m)초 후에 반응을 보였다. 거의 자동적으로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지시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앰버슨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신경이 쓰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인간의 보편적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대화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뭉개서 소음으로만 들리게 해 보았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게 하자 주의력이 분산돼 실수하는 비율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다. 작업 수행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앰버슨은 이 결과를 2010년 ?심리과학지?에 발표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반쪽 대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간의 뇌는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자동적으로 채워 넣으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의 반쪽 대화를 들으면 그걸 메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주의력이 분산되고, 그게 쉽게 메꿔지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사람은 내용이 있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이 실험은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타인의 휴대전화가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의 공간에선 가급적 통화를 삼가자. “조금 있다 통화하자”고 말한 뒤 바로 끊자. 5분쯤 늦게 전화한다고 하여 운명이 달라지는 일은 현실에선 거의 없다.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jhnha@naver.com

오피니언리더의 일요신문 중앙 SUNDAY 중앙 SUNDAY 디지털에디션을 통해 더 많은 기사를 만나보세요. 중앙SUNDAY는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국내유일의 일요배달신문입니다.
중앙Sunday Digital Edition 아이폰 바로가기중앙Sunday Digital Edition 아이패드 바로가기중앙Sunday Digital Edition 구글 폰 바로가기중앙Sunday Digital Edition 구글 탭 바로가기중앙Sunday Digital Edition 앱스토어 바로가기중앙Sunday Digital Edition 구글마켓 바로가기

![[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