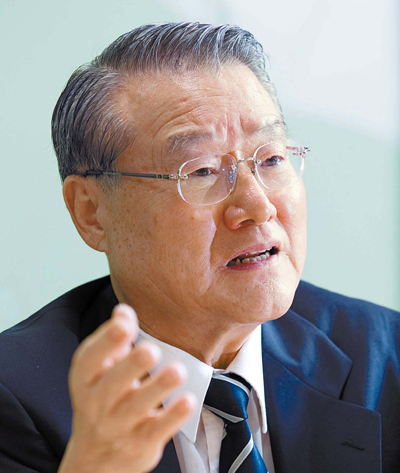 조용철 기자
조용철 기자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고,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로맨티시스트’란 별명을 갖고 있는 라종일(73) 한양대 석좌교수가 ‘남북 관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들려준 뜻밖의 답변이다. 그는 김대중(DJ)·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주영대사·주일대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조명하는 책을 냈다. 책 속에서 그는 ‘이 책이,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잊힌 젊은 생명들에 관한 하나의 증언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라 석좌교수는 201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회에 걸쳐 중앙SUNDAY에 ‘북한이 버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연재한 바 있다. 18일 오후 1시간30분가량 그를 만나 ‘강민철’과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아웅산 테러범 조명한 책 펴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강민철 스토리를 처음 접한 건 언제인가.
“국정원 해외담당 차장으로 있을 때다. 1998년 무렵인데 버마와 정보 교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강민철 관련 보고를 챙겨봤다. 당시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더라.”
-아웅산 테러 당시 두 명이 생포돼 한 명은 사형당하고, 강민철은 수감됐다. 그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버마에 가보니 생활환경이 형편없었다. 감옥 생활은 더했을 텐데 25살에 들어갔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북한은 모른 척했고 우리는 외면했다. 이후에 전두환과 김일성은 2년도 지나지 않아 친해졌다. 아웅산 테러의 직·간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친해진 거다. 그 틈새에서 하수인 노릇을 한 강민철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었다. 나라도 그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2008년 강민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책으로라도 살려내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은 어땠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당시 버마에 있던 (국정원) 파견원이 그를 만났다. 15년 만에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였다. 처음에 갔을 땐 적의가 많았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왜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며 억울하게 느꼈던 모양이다. 그런데 파견원과 얘기하며 적대감이 풀렸다. 자기 나이가 27살(사건 당시)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25살이라며 파견원에게 “형님”이라고까지 했다더라.”
-강민철이 한국행을 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DJ정부와 노무현정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정보 가치가 없다는 이유도 있었고, 데려오면 북한에서 ‘저건 남한사람이다’라고 주장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옛 상처를 다시 끄집어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이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여겼던 것 같다.”
-책에서 ‘기억의 투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민철에 대한 기억이 왜 중요한가.
“그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시키는 걸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강민철만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그저 ‘못된 북한 놈이 테러를 한 거다.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면 안 된다.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나쁜 일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한다. 과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다.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죽거나 땅에 묻히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아직 지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을 보면 ‘무조건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기억에 대한 이견(異見)은 통일할 수 없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거다. 리얼리티(reality)란 건 굉장히 복잡하고 규모가 크다. 어느 한쪽의 이해만 갖고선 설명이 안 된다. 다만 이견 때문에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또 갈등을 통해서만 진보한다. 기억에 대한 갈등에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강민철과 같은 희생자가 계속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웅산 사건도 정치적으로 해결돼 강민철이란 개인을 잊어버렸다. 북한 쪽도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라’고 했을 뿐 무사히 데려간다는 배려 자체가 없었다. 정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의 앞날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명의 사람에겐 한 시대가 담겨 있다. 그 시대의 문제점, 아픔, 희망이 모두 담겨 있다.”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남북한 모두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일을 정치적인 어젠다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공한 건 19세기 말 프러시아의 독일 통일이나 일본의 메이지유신뿐이다. 그 결과 강대한 근대국가가 됐지만 결과적으론 국민들이 불행했다. 통일은 휴먼 어젠다(human agenda)다. 통일 이후 생활의 질과 자기실현 기회를 지표로 삼아 통일을 하려고 해야 한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나는 햇볕정책의 방식을 ‘마태복음 햇볕정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솝우화 식 햇볕정책은 상대방 외투를 벗기는 거다. 한마디로 전략 개념이다. 마태복음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햇빛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굶주린 사람에겐 주체사상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쌀밥 한 그릇이 필요하다. 그런 걸 주는 게 햇볕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정권은 교류를 시작하면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도 (대한민국의) 안보 의식을 없애고, 친북세력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햇볕정책을 역이용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