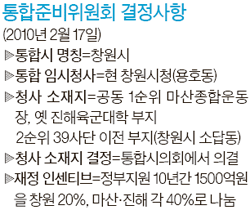
통합 창원시는 주민 자치에 의해 행정구역을 통폐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2010년 7월 옛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의회의 자율결정으로 출범했다. 단일생활권인 3개 도시의 통합은 공생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통합 2년9개월 만에 ‘마산시 분리건의안’이 마산 출신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합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 달라는 얘기다. 지역 갈등이 폭발하면서 ‘한 지붕 세 가족’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왜 마산 지역 의원들은 ‘통합’이란 명분에 반기를 든 것일까.
갈등의 발단은 통합시청사의 소재지 선정 문제에 있다. 3개 도시 대표들은 2010년 통합 당시 시 명칭은 창원시로 하되 신청사가 들어설 후보지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공동 1순위로, 창원 39사단 이전부지를 2순위로 정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는 통합 이후 2년9개월 동안 내내 신청사 소재지 문제로 갈등을 거듭해왔다. 통합 당시의 합의는 후보지 순위만 정한 것일 뿐 최종 확정은 통합시의회로 넘긴 것이어서 실질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세 지역 의원끼리 시청사 유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창원시의회는 통합 전 출신지별로 창원 21명, 마산 21명, 진해 13명으로 구성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에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재분리 움직임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마산의 소외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산은 1990년대 이후 계획도시 창원에 상권을 빼앗기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낙후 현상을 면치 못했다.
시세(市勢)를 역전당한 옛 마산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정체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마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역사성 있는 도시 명칭을 잃은 데다 청사 유치 문제까지 지지부진하자 “괜히 통합했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정부가 통합 이후 10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창원 20%, 마산·진해 각 40%씩 나누기로 했지만 소외감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통합시 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한 지붕 세 가족’의 갈등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67) 회장은 “통합 정신을 살려 시 명칭을 마산시로 하고 시청사를 창원에 두든지,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시의회만으론 한계가 있어 각계각층 대표들로 범시민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C씨(51)는 “완벽한 통합 이후의 시나리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정부가 자율행정구역 개편의 상징적 사례로 통합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 됐다”며 “행정구역을 붙였다 떼었다, 애들 장난하느냐”고 재분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22일 2020년까지 마산 지역 발전을 위해 국·도·시비 3조9303억원을 투입하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동하(57) 창원시 균형발전국장은 “원래 단일생활권이어서 통합 효과가 의외로 빨리 나타나고 있다”며 “통합시가 마산 지역 미래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