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유기농 포도원인 ‘승지농원’의 주인 최준혁·김영혜씨 부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포도밭에는 지금 지력과 통기성을 높여 줄 청보리와 호밀이 자라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유기농 포도원인 ‘승지농원’의 주인 최준혁·김영혜씨 부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포도밭에는 지금 지력과 통기성을 높여 줄 청보리와 호밀이 자라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해발 250m ‘승지농원’. 인근 추풍령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고랭지 포도를 생산하는 최준혁(65)씨가 수확이 끝나 가지가 앙상한 포도나무 밭의 땅을 가리켰다. 청보리와 호밀이 파랗게 자라 있었다. 청보리와 호밀은 겨우내 뿌리를 내리며 포도밭의 지력을 돋우고 통기성을 높인다. 친환경 농사다. 더 자라면 습도도 조절한다. 군데군데 플라스틱 막걸리 병도 매달려 있다. 농약 대신 달콤한 액체로 벌레를 끌어들이는 유인살충주다.
최씨는 6년 전쯤 포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유기농은 일반 포도보다 생산량은 떨어지지만 값은 2∼3배인 1㎏에 1만원 안팎을 받는다. 포도는 수확하면 친환경 농산물 전문 매장인 초록마을과 백화점 등으로 모두 나간다. 안전한 먹거리 인기에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섬유회사 등을 경영하다가 15년 전 귀농한 최씨는 이 일대 1만1600㎡(3500평)를 사들여 친환경 포도 캠벨을 재배한다. 올해는 매출 6000여 만원에 3000여 만원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포도를 가공한 포도즙에 이어 포도주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또 한번 농민들 의욕을 꺽고 있습니다. 허탈·배신감이랄까. 미국산 오렌지가 싼 값으로 들어오면 사과·포도 등 국산 과일은 위축될 게 뻔하지요. 그러나 유기농산물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최씨는 희망을 말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포도 값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인건비는 그 사이 1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자재비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국내 포도 농가는 4만 호에 이르지만 유기농은 아직 100농가에 못 미치는 걸음마 단계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는 과일이 축산에 이어 두번째로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포도는 사과 다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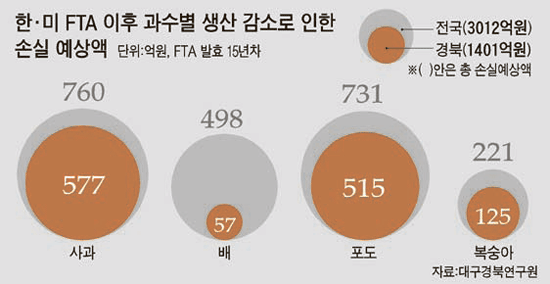
상주시는 고랭지 포도의 주산지다. 특히 백화산 자락인 모동·모서·화동 등 3개 면(面)은 고랭지 포도특구로 지정돼 있다.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심해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뛰어나다. 포도 농가들은 “기름값이 끝없이 오르는 데다 수입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견뎌낼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최씨는 “한·칠레 FTA와 한·유럽연합(EU) 때는 수송 기간이 긴 데다 와인용 소비가 절대적이어서 포도 농가에 타격이 크지 않았다”며 “미국에 이어 앞으로 한·중·일 FTA까지 바라본다면 품질 고급화가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포도 소비량이 한 해 10㎏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포도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다. 유기농산물은 친환경 급식 등으로 국내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는 “수입되는 과일은 친환경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거기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 상하이 백화점 등 중국 고급 시장도 한국 농산물을 점차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한다. 유기농은 역발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그래서 한방영양제에 목초액을 뿌리고 천적을 이용해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새로운 유기 농법을 끝없이 실험하고 있다.
글=송의호 기자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