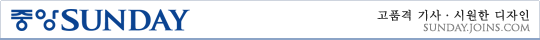둘은 결국 만났다.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는 주가 간극은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5만원대에서 극적으로 조우했다. 3년 전 17만원대였던 삼성SDI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해 1일 현재 5만5300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비해 3년 전 1만원 선이었던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5만3600원으로 날아올랐다. 화려한 백조와 미운 오리새끼가 서로 옷을 바꿔 입은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증권가에서 10년 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꼽을라치면 삼성SDI가 꼭 손가락 안에 들었다. 반면 삼성테크윈이 디지털카메라에 도전장을 내밀자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일본 회사들도 코웃음을 쳤다.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은 최근 5년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주가는 꿈을 먹고 크지만 눈물도 따라다닌다. 한 지붕 두 주식의 ‘역전 스토리’엔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는 엄정한 교훈이 숨어 있다.
“마치 서자(庶子)와 적자(嫡子)의 운명 같다고 할까요.” 증권가의 A 애널리스트는 삼성SDI를 이렇게 묘사했다. 처음에 삼성SDI가 손댔던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을 그룹의 맏형인 삼성전자가 가져가면서 탈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0년 10월 LCD의 핵심부품인 컬러필터 사업을 SDI로부터 3600억원에 인수했다. 대신 SDI는 플라즈마표시판(PDP)과 2차 전지 등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A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삼성SDI의 저력을 믿었다. 브라운관 세계 1위의 실력을 밑천으로 PDP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황제가 될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시장의 무게중심이 LCD로 옮겨가자 PDP는 불효자로 전락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이 변화무쌍해 주류 흐름을 한 번 놓치면 낙오한다. SDI는 2003년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브라운관(CRT) 제품의 끝물이었다.
돌파구로 삼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도 비슷했다. OLED는 빛을 쏴주는 장치가 필요없어 접거나 입을 수 있는 신개념 디스플레이지만 삼성전자도 같은 사업에 뛰어들었다. 같은 OLED라도 휴대전화 쪽은 삼성SDI가, 모니터 분야는 삼성전자가 맡아 경계가 확실하다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모니터급 이상에서 성공해야 돈 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 전략기획실의 B임원은 “그룹 차원에서 영역조정 등은 달리 고려하지 않는다”며 “각사 특성에 맞게 기술개발을 할 뿐이고 대형제품 시장에선 PDP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가 힘들었고 우리는 전문업체라 더 어려웠다”며 “내년 베이징 올림픽 특수 등을 고려하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단순하게 단기 업황이 아닌 장기 성장전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업체인데도 LCD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게 치명적 약점이다. 미래에셋증권 이학무 애널리스트도 “올해 LCD 세계시장 규모가 60조원이고 PDPㆍCRT는 10조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엉크러짐은 계속됐다”고 했다. 예컨대 시장에선 2006년 상반기에 대형 TV 시장이 좋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SDI는 2005년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뒤늦게 기존 3개 라인에 더해 4번째 라인을 곧 가동키로 하면서 물량 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의 ‘못난이’로 불렸던 테크윈은 신데렐라로 거듭났다. 요즘 증권사가 쏟아내는 보고서엔 ‘꺼지지 않는 불꽃’ ‘아직 보여줄 게 많다’는 제목의 찬사가 넘친다. 1977년 창립한 뒤 항공기 엔진과 필름 카메라 사업을 하던 테크윈은 외환위기 유탄을 맞아 삼성에서 퇴출 1순위로 꼽힐 만큼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테크윈은 올해 북미시장에서 490만 대의 디지털카메라를 출하해 점유율 11%로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넘지 못할 아성 같던 올림푸스(5위)ㆍ니콘(6위)도 제쳤다. 디카는 수술대에 올랐던 테크윈의 변신을 주도한 효자다.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외환위기 뒤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차기 핵심사업을 찾았다”며 “처방전으로 잡아낸 게 디카였다”고 설명했다.
마침 2000년을 전후로 산업의 큰 흐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카메라도 혁명기를 맞았다. 일본의 경쟁 업체들보다 2년 정도 늦은 투자였지만, 다른 첨단기능을 결합한 ‘컨버전스’ 제품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시장의 욕구를 제때 읽은 제품을 내놓자 큰 반향이 일었다. 예컨대 2005년에 출시한 ‘# 1’시리즈는 경쟁사들이 내놓지 못한 약 17㎜짜리 초슬림 디자인에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나 MP3 재생 기능까지 담았다. 요즘엔 여행정보까지 탑재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활짝 웃게 됐다. 2005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테크윈은 잘 짜인 사업구조를 갖춰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한국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항공기 수요가 늘면서 테크윈의 엔진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고,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소로 훈련기ㆍ자주포 등 방위 부문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SDI와 삼성테크윈의 사례는 영원한 우량주는 없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기투자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나 새로 뜨는 사업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회사의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하는 게 진짜라는 얘기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선 옛날의 영화에 눈이 멀지 말고 회사가 질적 도약을 통해 매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지, 이후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새 모멘텀이 있는지 꾸준한 학습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