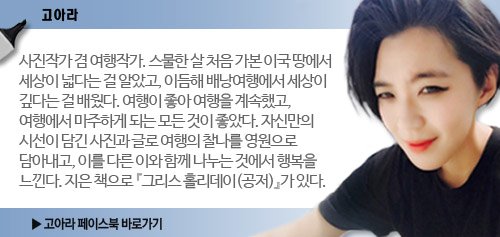레이캬비크를 떠나 첫 번째 목적지인 스나이펠스네스 반도(Snæfellsnes Peninsula)로 향했다. 신호등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기어코 도시가 등 뒤로 저물었다. 눈앞에는 오직 광대한 자연만이 펼쳐져 있었다. 넋을 놓을 수밖에 없는 풍경이었다. 한참을 달려도 감탄사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훅훅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아쉬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는 오직 나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온전히 나만의 길이었다. 그저 내 길을 가다가 풍경이 불러 세우면 멈춰 서서 원하는 만큼 머물면 될 일이었다.

습관이었다. 목적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스치는 모든 것들을 놓치는 것도 습관이었다. 익숙해진 세상이 지겨워 떠났지만, 그곳에서 얻은 버릇까지 떠나진 못한 것이다. 이곳에는 나를 뒤쫓는 차도, 앞지르는 차도, 앞서가는 차도 없었다. 잡아둔 숙소도 없었고 딴 곳으로 센다고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가고, 멈추고 싶은 곳이 있으면 멈추기로 했다.

샛길이 보였다. 구불구불 들어가는 길의 모양은 보이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자갈길에 차가 덜컹덜컹했다. 지프로 도강하는 것도 아니고 정글을 헤쳐 가는 것도 아닌데 흥분감은 그 못지않았다. 무서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샛길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또렷하고 맑아졌다. 차를 세우고 조금 걸었다. 우뚝 솟은 설산이 보였다. 설산을 마주하는 순간, 맑고 투명한 보석들이 떠 내려와 내 품에 가득 안겼다.
2-2. 검은 교회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남쪽, 부디르(Búðir)라는 곳에는 오래된 검은 교회가 있다. 검은 교회. 말 그대로 외관이 온통 검은 칠이 돼 있어 붙은 이름이다. 검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아이슬란드의 가혹한 날씨 때문이라고 읽은 적이 있다. 변덕이 죽 쓰는 아이슬란드의 날씨 때문에 나무로 만든 건물은 온전하기 힘들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외벽에 검은 송진을 칠했다는 것이었다.
부디르에 도착했을 때 역시 날씨는 잔인했다. 바람에 얼굴은 오만상이 되고 눈물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내 몸에도 송진을 바르고 싶을 지경이었다. 검은 교회의 탄생 배경을 온몸으로 이해하며 건물 가까이 다가갔다. 1703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파손과 재건을 반복하여 1986년이 돼서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건물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이 눅진하게 배어 있다.

교회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검은 몸통과 대비되는 하얀 창문, 동그란 문고리, 칠이 벗겨진 대문. 아이슬란드의 소박한 정서가 느껴졌다. 돌담을 지나 교회의 뒤편으로 걸어갔다. 드넓은 라바필드를 덮은 빛바랜 갈대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검은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이 황량한 땅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혼자 서있었을 것이다. 그 외로운 시간을 상상했다.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졌다.
갈대밭 사이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다. 저 멀리 사람이 보였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여자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연인인 것 같았다. 그렇게 휘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붉어지고 갈대들이 반짝였다. 그러곤 마치 무대 위의 핀 조명처럼 그들을 밝혔다. 외로운 땅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낭만적이었다. 교회를 다시 바라보았다. 노을에 젖어 붉어진 교회의 모습이 찬연했다. 둘보다 아름다운 혼자였다.
2-3. 위로

여행의 첫날밤은 리프(Rif)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내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반절은 저물어 있었다. 일몰 시각에 상관없이 해가 저문다는 것은 날이 저문다는 것이고, 하루가 끝나간다는 의미다. 나에게는 여행의 첫날이 저물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손바닥만 한 마을에 고작 하나 있는 슈퍼마켓의 불도 꺼졌다. 옆 가게의 점원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쉴까 하다 마음을 돌려 항구로 향했다. 항구 한쪽에는 어선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감을 준비하고, 어부 아저씨도 밧줄로 배를 꽁꽁 묶으며 바다를 떠날 채비가 한창이었다.
괜스레 마음이 공허했다. 여행의 첫날밤은 언제나 그랬다. 가장 설레는 날이기도 하지만 쓸쓸함이 제일 많이 느껴지는 날이기도 했다. 짙게 밴 일상의 향기를 잠시 잊고 새로운 향기를 맡기 위해선, 적어도 하룻밤은 지나야 했다.

항구를 어슬렁거리다 방파제에 앉았다. 공기가 푸르렀고 산이 푸르렀고 바다가 푸르렀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푸른 시간이었다. 밝지도 어둡지 않은 애매한 시간이자 나에게는 일상에서 여행으로 넘어오는 경계의 시간이기도 했다. 푸른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달이 천천히 노랗게 차오르고, 주변은 어느새 어둠이 완연했다.
청승 떠는 것은 이쯤에서 그만두자며 자리를 뜨는데, 밧줄 정리를 끝낸 어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해주었다. 쓸쓸했던 마음이 달빛에 데워지고, 아저씨의 손 인사에 눈 녹듯이 풀렸다.
여행이 그렇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못 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 그것이 여행이다.

![[오늘의 운세] 5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충청도 일반고에선, 전교 3등도 의대 간다 [지역의대 전성시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9/19af20ca-7f64-41e7-80b0-a9f30edf9bba.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