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나 그린이 지난주 공연한 연극 ‘Journey to the east(동쪽으로의 여행)’의 포스터. 왼쪽 사진은 모나 그린이 노르웨이로 입양될 당시인 세 살 때의 모습과 손목에 찼던 인식표. [사진 모나 그린]
모나 그린이 지난주 공연한 연극 ‘Journey to the east(동쪽으로의 여행)’의 포스터. 왼쪽 사진은 모나 그린이 노르웨이로 입양될 당시인 세 살 때의 모습과 손목에 찼던 인식표. [사진 모나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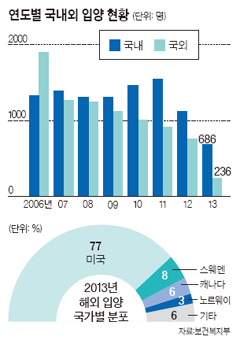
그녀는 “한국인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기쁘고 흥미롭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 TV 및 연극 배우, 성우로 활동 중인 모나 그린(38·사진). 노르웨이의 한 내비게이션 제품에서 나오는 안내방송 음성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세 살 때인 1979년 이곳으로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장윤진(Jang Yoon Jin).
노르웨이 이방인에서 배우로 성공, 한국인 입양아 모나 그린
23일부터 27일까지 오슬로의 한 극장에서 ‘Journey to the east(동쪽으로의 여행)’란 제목의 연극 무대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노르웨이의 한 신문에 그린이 ‘이방인’ 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마침 출장차 노르웨이에 머물고 있던 기자는 기사와 함께 실린 한글로 된 ‘여행증명서’ 사진을 보고 그녀가 한국인임을 알게 됐다. 현지에 있던 한국인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오슬로 시내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그린은 “내 얘기가 한국 신문에 실린다는 게 꿈만 같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연극 포스터에 ‘동쪽으로의 여행’이라고 한글로도 적어 놓은 것을 봤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인가.
“이번 공연은 ‘나’라는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입양당한 경험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싶다. 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잘 알지 못하는 도시’인 서울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다. 당시 나는 나의 ‘생물학적 엄마’를 찾기를 원했다. 알 수 없는 공허감을 채우고 싶어 2007년 고국 땅을 밟았다. 여행은 아름다웠지만,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동쪽으로의 여행은 감상적이었고 힘든 경험이었다. 입양아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한다. 입양은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다.”
그린은 2007년 한 입양단체의 주선으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입양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중학교 때인 1991년 노르웨이 걸스카우트 단원 자격으로 설악산을 찾은 적이 있었지만 느낌은 180도 달랐다.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에 놀러 왔다’는 생각은 두 번째 방문에선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고, 이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그린의 엄마로 추정되는 ‘박씨 아줌마’를 찾았다. 하지만 박씨는 “나는 아들이 두 명이고, 딸은 없다”며 “나도 당신의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는 말만 전해왔다. 그린은 “그 박씨 아줌마가 나의 엄마로 생각되지만 더 이상 찾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의 나라’인 노르웨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갔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꼴이 된 것 같다. 한국에 대한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번 연극의 주제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끝없는 숙제를 풀고 싶었던 것이지, 한국에 대한 미움이나 애정은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여전히 서울이라는 ‘아시아의 정글’ 같은 도시에 틀을 맞추고 나의 뿌리와 자존감을 찾고 싶다. 나에게 서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신비로운 곳이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 버려져 외국으로 입양을 당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노르웨이라는 먼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속 응어리가 나의 영혼에 마치 못처럼 박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에게 남겨진 ‘블랙홀’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린의 주장처럼 그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방황은 사춘기를 지나 20대 중반까지 계속됐다.
“어릴 때 오사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다. 부모님은 나에게 아주 친절하고 관대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맞지 않고 같은 커뮤니티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톨이였다. 군중들 밖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노르웨이에선 당연한 기준이었고, 그게 나한테도 좋았다.”
그녀가 자유를 찾은 곳은 한국도 노르웨이도 아닌 미국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린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995년부터 2년간 보모 일을 했다. “나를 억눌러왔던 알 수 없는 억압에서 벗어난 느낌이었다. TV 미디어 학교를 함께 다니며 나의 재능을 알 것 같았다.”
1997년 노르웨이로 돌아온 그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 뮤지컬 ‘미스 사이공’ 오디션에 도전했다. “노래와 무용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네 번의 오디션을 통과해 10명만 뽑힌 최종 선발전까지 갔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에겐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생의 전환점은 이미 시작됐다.
-이후 당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다.
“오슬로의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비디오 업체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2의 연속극인 ‘일곱 자매’에 조연으로 나왔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서 갑자기 영감을 얻게 됐다. ‘그래 지금까지 나는 카메라의 반대 방향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1999년 노르웨이-아메리칸 협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미국 LA로 유학 가 드라마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 4년간 극장과 연기는 나의 룸메이트였고, 나의 연인이었다. 셰익스피어를 연습하며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베벌리힐스와 할리우드, 스타벅스 등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쪽으로의 여행’의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는 신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이런 ‘블랙홀’을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옮겨놓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겐 중요하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밝은 눈으로 볼 것이다. 압박과 자포자기, 절망이 다시는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신 한국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사랑과 긍지를 내 아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관용이 차 있고, 내 아들과 가족을 위해 계속해 전진할 것이다.”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해 17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는 그린에게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 여성의 불행한 삶을 다룬 영화)’의 잔상은 이미 사라진 듯 보였다.
오슬로=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e66a155-7b88-4f53-bae4-abe4969cbc90.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