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김연수 외 지음
봄날의책, 336쪽
1만3000원
누군가가 평생 한 점 한 점 모아놓은 아름다운 수집품을 보면, ‘이렇게 타인의 평생을 손쉽게 엿봐도 되나?’ 싶어 행복한 죄책감에 빠져든다. 무언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엔 젬병인 나는 모자이크나 콜라주처럼 작은 조각이 모여 이루어내는 커다란 그림에 매혹된다. 저마다 다른 빛깔을 내는 형형색색의 작은 구슬이 모여 거대한 벽화를 이룬 듯 뭉클한 글 모음집도 그렇다.
이 책은 단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 저마다 다른 곳에서 울리는 온갖 종소리를 모아 한 곳에서 울리게 만드는 거대한 합창이다. ‘노동의 풍경과 삶의 향기를 담은 내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부제보다 훨씬 크고 깊숙한 의미로 다가온다. 글쓰기가 곧 직업인 소설가나 시인들뿐 아니라 농부·우체부·교사·사진작가·요리사·기자·학자들의 서로 다른 숨결이 불규칙하게 섞였는데도 전혀 요란하거나 부산스럽지 않다.
소설가 이기호는 삭막한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기적처럼 아련히 반짝이는 반딧불의 무리를 발견한다. 알고 보니 그건 반딧불의 행렬이 아니라 집집마다 쓸쓸한 가장들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몰래 베란다에서 피워 올리는 담뱃불의 행렬이었다. 아파트단지의 담뱃불들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아련하게 깜빡거린다. “모두 각자 쓸쓸한 도깨비불이 되어, 깜빡깜빡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조난 신호라도 보내듯, 천천히 담배를 피운다.”
소설가 김별아의 글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에서 아버지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회복하셨지만, 시력을 되찾는 대신 아직은 노인이 아닌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수술이 잘 되어서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지긴 했는데…. 눈이 침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웬 백발노인이 거울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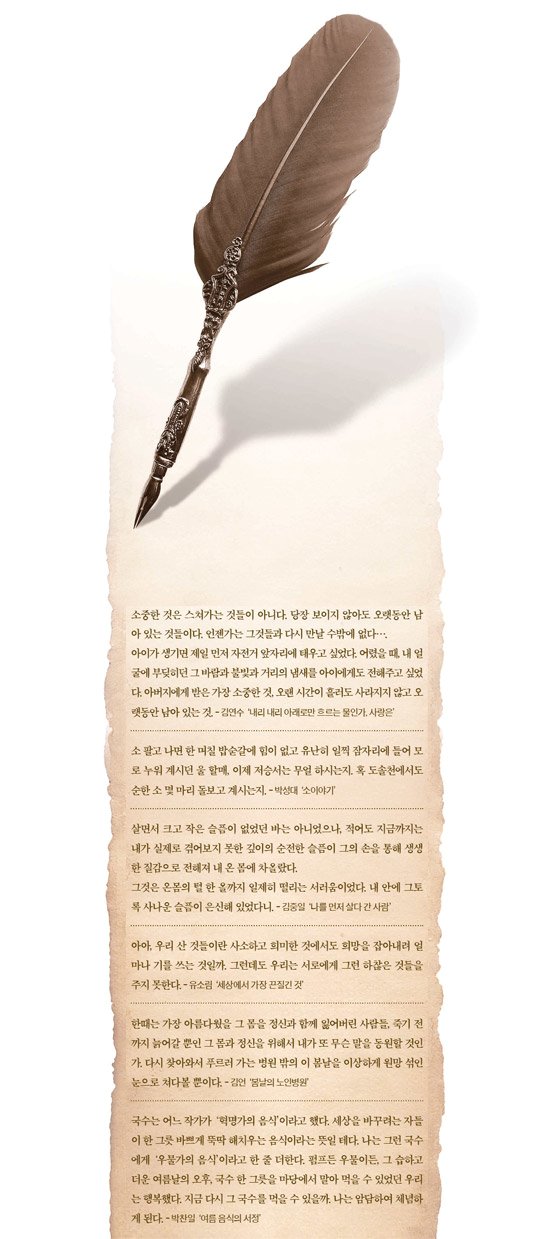
이영주 시인의 ‘빛의 통로’를 읽다가 나는 문득 깨닫는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만질 때 안쪽의 장기들을 만질 수가 없는 운명.” “나는 그저 내 피부만을 만지다 사라질 뿐이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 피부의 안쪽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했던 이의 속마음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듯이.
서효인 시인의 ‘증명하는 인간’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기쁨으로 한참 설레던 순간 때맞춰 등장해준 첫 아이.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들은 말은 간호사들의 걱정 어린 대화였다. “다운이 같아, 그치?” 호흡에 문제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아이는 안타깝게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나는 급격하게 무너져서, 며칠을 많이 울었다. 누군가 태어난 날에, 누군가 죽은 것처럼.” 평생 행복한 글쟁이로 살고 싶었던 시인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태어나버린 아이가 훼방 놓을까봐, 두려웠단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하지만 힘겨운 심장수술을 마친 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싸고, 울고, 보채는 아기를 보며, 그의 두려움은 어느덧 행복으로 바뀐다. 시인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글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다. “예전에는 내가 낳은 건 대부분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시큰둥하다. 아내가 낳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예쁜 피조물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은 시인의 ‘상(床), 상(賞), 상(象)’은 지금껏 내가 읽어본 가장 아름다운 자기소개서다. 물론 이 글도 목적은 자기소개가 아니지만, 자신이 평생 써왔던 ‘책상의 역사’를 펼쳐놓는 그의 글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기소개서처럼 보인다. 레스토랑에 딸린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모여 살던 어린 시절, 소년의 책상은 매일 모두가 밥을 먹는 밥상이었다. 밥 먹을 때는 밥상이 되고, 아버지와 바둑판을 올려놓고 오목을 둘 때는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는 후끈한 도박장이 되고, 방학숙제를 할 때는 훌륭한 작업대가 되어주는 만능 책상이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마침내 밥상이 아닌 어엿한 책상을 쓰게 되었을 때도, 그는 10년 넘게 자신을 지켜준 상이 그리워 엉엉 울었다고 한다. 건드릴 때마다 끼익 쇳소리가 나던 낡은 밥상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성장시켜준 마음의 텃밭이었나 보다.
이렇듯 이 책에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준 마음의 불빛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간지러운 말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숨죽인 애정 표현으로 가득하다. 이 책을 만나면 ‘아직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는 반가움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뜨뜻해진다. 세상을 마치 자기만의 1인분 스테이크처럼 여기는 강자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스스로 약자의 자리를 긍정하며, 나약하지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은 일인 분짜리 라면 한 그릇이라도 춥고 아픈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무작정 감사하게 된다.

이 책은 저마다 다른 크기의 빗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따로 또 같이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듯, 그렇게 차분히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앞둔 우리 자신에게 주머니 속의 손난로 대신 마음을 데우는 뜨거운 책난로를 선물하고 싶어진다.
여울 문학평론가
●정여울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문학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을 써오고 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마음의 서재』 『잘 있지 말아요』 등을 냈다.
관련기사
▶ 문자와 동학, 근대 시민을 깨우다『시민의 탄생』
▶ 5000년 이야기 보고…『고찰명, 중국 도시 이야기』
▶ 한국사회 30대 생활 보고서『이케아 세대, 그들…』
▶ 미 역사학자의 죽비…『역사를 기억하라』
▶ 집 밖으로…『게으른 작가들의 유유자적 여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