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북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중앙정원에서 김영일 원장(가운데)과 병원 관계자들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손을 모아 다짐하고 있다. [김천=프리랜서 공정식]
9일 경북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중앙정원에서 김영일 원장(가운데)과 병원 관계자들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손을 모아 다짐하고 있다. [김천=프리랜서 공정식]경북 김천의료원의 2008년 상황은 지금의 진주의료원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한 이후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누적적자가 224억원에 이르러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다. 직원 임금은 17억원이 체불됐다. 직원들의 의욕이 땅에 떨어지자 병원은 불친절해졌다.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은 3.9%의 임금 인상을 관철시켰다.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2009년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영일(59)씨가 공모를 통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였다. 김 원장은 원장실에 야전침대를 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심야엔 당직자를 격려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빵을 구워 주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전 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을 살릴 방안을 토론한 결과 친절하고 청결하고 돈이 들더라도 낡은 장비는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처음엔 “내년에 시장 선거에 나가려 쇼를 하는 것”이라고 백안시하던 직원들의 마음이 차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스스로 노조를 탈퇴했다. 취임 당시 조합원 수가 126명이었으나 지금은 8명만 남았다. 직원들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5개월 동안 급여의 5~15%를 자진 반납했다. 원장은 50% 반납으로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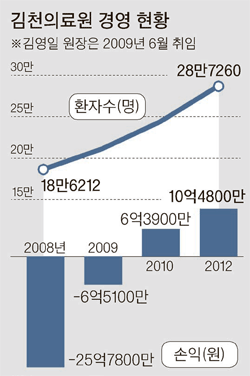
병원이 친절하고 시설이 깨끗해지자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팔이 부러져 입원한 유계순(75·여·김천시 부곡동)씨는 “의사·간호사가 너무 친절해 아픈 줄도 모르고 수술했다”며 “예전에 비하면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2008년 18만여 명이던 환자는 지난해 3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수익도 급증해 2010년 사상 처음 흑자로 돌아섰다. 병상은 165개에서 282개로 확장됐고 직원도 100여 명을 더 고용했다. 김천의료원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수익만으로도 흑자를 내는 병원이 됐다.
진주의료원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는 또 있다. 같은 경상남도 산하인 마산의료원도 폐업 위기를 딛고 회생에 성공한 경우다. 96년 1월 마산의료원은 한 해 15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경영쇄신책으로 경상대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듬해 재개원한 마산의료원은 모든 면에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무릎관절 수술과 재활치료, 신장투석실 등을 특화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의사 대부분은 경상대 출신으로 충원됐다. 선후배 의사가 근무하면서 이직이 없어지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졌다. 각 과에서 수술이 있을 때는 경상대병원 의사들이 파견돼 수술을 집도했고, 의료진 공백이 생기면 경상대병원과의 협진체제로 이를 메우기도 했다. 장세호(52) 원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마산의료원에 가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민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 전 7만 명 수준이던 환자 수가 98년부터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부터는 20만 명을 넘겼다. 마산의료원의 적자는 2010년 이후 연간 3억~10억원대로 연간 51억~69억원씩의 적자를 낸 진주의료원과 대비된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공익성을 감안할 때 마산의료원의 적자 폭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천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의 회생 과정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경영자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의료 품질의 향상 노력이 결합되면 눈덩이 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의호·황선윤 기자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e66a155-7b88-4f53-bae4-abe4969cbc90.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