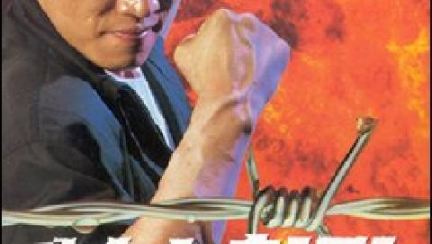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한·아세안 시인 문학 축전’이 5일 3박4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그간 중국·일본에 치우쳤던 우리네 문학 교류를 동남아시아까지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외교통상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8개국의 시인 12명과 한국 문인 20여 명이 서울·안산·속초 등지에서 시 낭송회 등을 열고 ‘아시아적 정체성’을 함께 모색했다. 참가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다.
이번 행사는 중견 시인 고형렬(56·사진)씨가 주도했다. 그가 아시아 시인들의 작품 소개를 위해 2000년 창간한 시 전문 계간지 ‘시평(詩評)’을 운영하며 축적한 동남아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했다. 조직위원장을 맡아 후배 시인 장무령씨와 함께 기획부터 진행까지 챙겼다.
7일 오전 고씨를 만났다. 그는 좀 피곤한 표정이었다. 고씨는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같은 아세안 국가라고는 하지만 8개 나라의 언어가 모두 다르다 보니 역시 공용어는 영어였다. 헌데 영어를 못하는 경우 시인의 모국어를 일단 영어로 옮기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통역해야 했다. 자연히 행사 진행이 더뎠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아세안 시인이 서로 어울리기보다 아세안 시인끼리 더 많이 어울리는 현상도 벌어졌다.
고씨는 그러나 “그런 언어의 장벽이 오히려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고씨가 보기에 시의 의미와 감동은 어차피 언어로 낱낱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이다. 번역된 외국 시의 경우 더 그렇다. 고씨는 동남아 시인들이 시를 낭송할 때 대부분 언어에서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말을 모르니 뜻을 알 수 없지만 낭송자의 표정, 제스처, 언어의 음악성 등에서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심전심으로 느낄 수 있었죠.”
고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소통의 가능성을 봤다. “언어의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난 경지라야 오히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판이한 시인들 간에 공감이 폭이 커진다는 역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공연적 요소가 강한 동남아 시인들의 낭송 스타일도 한국 시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동남아 시인들은 대부분 볼펜 같은 간단한 도구를 준비해 보여주는 시 낭송을 했다. 특히 태국 중부의 오지에서 온 삭시리 메솜습 시인은 태국어 특유의 성조를 바탕으로 한 시 낭송 방법인 ‘세에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우리의 시조창 같은 느낌을 주는 특이한 낭송법이다.
“우리 문학이 1970∼80년대를 거치며 통제와 억압을 경험한 탓인지 시 낭송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인들은 낭송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비해 동남아 시인들은 한결 자유분방했죠.” 고씨는 "익숙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경험하기 위해 10년 전 시작한 계간지 ‘시평’ 발간의 결실이 이번 행사”라고 말했다. 아세안 지역 시인들과 교류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동남아 시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열고 싶다는 사람이 제법 됐거든요.”
신준봉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