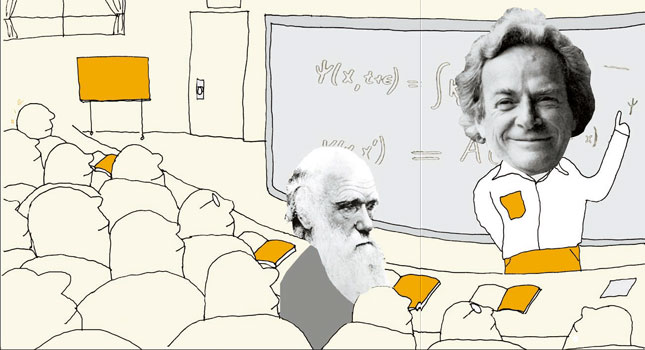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의 한 대형 강의실. ‘올해의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을 듣기 위해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려들었다. 다윈도 맨 앞줄에 앉아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런던으로 돌아가 새해를 맞기 전에 그는 오늘의 연사를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 이 연사는 양자전기역학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1965년)을 수상한 이 대학 물리학과의 리처드 파인만 교수다. 강연이 끝난 파인만 교수에게 다윈이 악수를 청했다.
장대익 교수가 열어본 21세기 다윈의 서재<21>-리처드 파인만의 『파인만!』
다윈=파인만 선생, 강연 잘 들었습니다. 물리학의 문외한인 나도 어느새 양자의 기묘한 세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성공이네요. 사실, 교과서의 공식적인 양자역학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식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하.
다윈=수식 하나 쓰지 않고도 이렇게 훌륭한 물리학 강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런 명강의를 놓칠 수 없어서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것 아닙니까?

파인만=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처음엔 좀 긴장은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설명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거든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어쩌다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지도교수가 폰 노이만(컴퓨터 이론의 아버지), 파울리(1945년 노벨물리학상) 등과 같은 대가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이거 큰일났다 싶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인슈타인도 납신다는 겁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긴 했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니까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잊혀지더군요.
다윈=나도 책에서 그 에피소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체 그런 담력은 어디서 배운 거요?
파인만=아버지는 늘 권위에 굴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워서 그런지, 권위와 격식 같은 것은 체질적으로 딱 질색이에요. 남이 그런 행세를 하면 되레 놀려주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은, 스웨덴 왕실의 격식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노벨상을 탔다고 해서 권위를 조롱하던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윈=정말 그 얼마 안 되는 격식이 그렇게도 힘들던가요? 노벨상에 목매는 과학자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과학자의 최고 영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선생이 정말 특이하군요.
파인만=사실,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는 11월에는 이름깨나 있는 과학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죠.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 그 새벽에 전화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다시 전화해 달라”며 끊고는 그냥 자려 했어요. 계속 울려 대는 전화 소리에 결국 그러지 못했죠. 솔직히 노벨상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윈=아휴, 속이 다 후련하네요. 요즘 보면,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는 식이 아니라 되레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풍토가 대세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정책도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죠. 우리 때는 그런 상도 없긴 했지만, 자연에 대한 탐구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만일 그때에도 요즘 같은 성과주의가 만연했었더라면 20년의 숙성 기간이 필요했던 진화론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처럼 노벨상을 좀 우습게 여기는 과학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인만=뭐, 상금은 좋더군요. 조그만 별장을 하나 샀죠. 하하. 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 의미, 그리고 돈. 제 경우, 그중에 제일은 ‘재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맹세를 했죠. 재미없는 일은 평생 안 하겠다고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주로 돈에, 그리고 ‘노벨상 수상의 영광’과 같은 의미에 너무 집착하며 사는 것 같아요.
다윈=그러면, 선생은 오늘 같은 강연도 다 재미 때문에 하는 거요? 이 책의 어딘가에서 그랬죠? 선생은 노벨 물리학상보다 물리학을 훌륭히 가르친 공로로 받은 물리교육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파인만=사실이에요. 대가들끼리 자신들만 아는 용어로 고준담론을 펼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일상 언어로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는 거장의 권위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문외한인 그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 진짜로 알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일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대가라 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윈=이 후련함의 연속! 나도 노력했어요. 런던의 노동자들도 『종의 기원』을 읽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췄죠. 세상을 바꾼 ‘과학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수식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당시에 누구나 관심이 있었던 비둘기와 개의 육종 이야기로 책을 시작했죠. 복잡한 논의도 더러 있긴 하지만 중심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오죽하면 내 친구 헉슬리가 제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보 같이 왜 난 이걸 먼저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파인만=저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강연을 했고 책도 많이 냈었는데요, 복잡한 현대 물리학을 쉽게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윈=특급 물리학자 중에서 선생처럼 책을 많이 낸 사람도 드물걸요? 나는 그중에서 세 권짜리 『물리학 강의』를 최고로 칩니다. 지식이 아니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죠.
파인만=아 그 ‘빨간책’(표지가 빨간 색으로 되어 있음)요? 학부 학생들을 위한 기초물리학 강의였는데요, 재미 그 자체였죠. 전 정말 재미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하하.
※파인만은 1988년 암으로 사망했고, 그를 추모하는 인파로 추도식이 두 번 치러졌다.
※다음 호는 ‘다윈의 21세기 서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책이 올라올까요?
KAIST 졸. 서울대에서 진화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대에서 자연과 인문의 공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윈의 식탁』을 썼다.
![[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