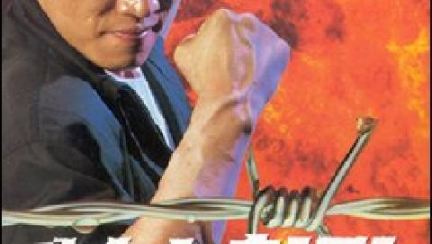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설명하기 위해 나의 어린 시절인 중국의 1970년대 중반으로 시계바늘을 돌리고 싶다. 중국도 개혁·개방 전 험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내 부모님은 참전 군인 출신의 간부였다. 아버님은 행정직급이 높아서 월급도 많았지만 식량 배급 역시 100% 입쌀과 밀가루로 받았다. 그럼에도 식량이 부족해 아버지 앞으로 받은 입쌀을 시장에 갖고 나가 강냉이로 바꿔먹어야 했다. 과자나 알사탕은 어머니의 월급날에나 기대해볼 만한 사치였다.
밖에서 뛰놀다 배가 고프면 집에 들어와 노란 강냉이밥에 기름 몇 방울이 들어간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추어 먹곤 했다. 물론 그것도 콩기름이 아니라 돼지고기 비곗살에서 나온 하얀 고체 상태의 기름이었다. 그래서 비곗살 가격이 살코기보다 더 비쌌다. 방학 때면 시골 친척집에 놀러 가 물고기와 벌레를 잡아 구워먹었다. 필자가 입던 옷은 형·누나의 헌옷을 고친 것이었다. 겨울엔 형을 따라다니며 공장·기업소의 보일러실 근처에서 미처 덜 탄 석탄(코크스)을 줍고, 가을 추수 뒤에는 콩 이삭과 배춧잎을 찾아다녔다. 과수원의 과일을 훔쳐먹다 실컷 얻어맞고 반성문을 쓴 적도 있다.
그때 홍콩인가 대만에서 전자시계가 중국 대륙에 들어왔다. 자그마치 인민폐 180위안이었는데 누나의 1년치 월급과 맞먹었다. 그래도 전자시계를 찬 사람들이 꽤 있었다. 가끔씩 동네사람의 해외 친척이 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 집은 동네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 집 아이들은 또래들이 못 먹던 외국 과자나 사탕을 들고 우쭐댔다.
나라와 시대가 다르지만 북한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이런 세상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즉 대부분 주민들은 ‘먹을 수만 있다면’ ‘먹기만 한다면’ 만족하는, 극단적인 저소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재정·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북한에서는 국가계획 역시 각각의 중앙기관으로 쪼개져 추진된다. 크게는 당·내각·군수 경제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당 기관도 부서별로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다. 내각 경제 역시 성(省)별로 나뉜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중앙기관마다 외화를 벌 수 있는 자산을 분배해 주고 자기네 직원들의 생계를 챙기도록 한다. 국가계획하에 ‘자력갱생’을 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의 정부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재정 운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친척의 도움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하는 북한 가정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자력갱생 비중은 커진다. 즉 계획이 아니라 시장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 중앙기관의 말발이 잘 먹히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개성공단은 중앙당의 힘 있는 기관의 자금줄이지만 지방정부인 황해남도(개성시)에는 떡고물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곤 한다. 개성공단 운영에 여러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우물 정(井)자를 활용하면 북한 경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로선은 중앙정부·기관 경제, 가로선은 지방·해외 경제이지만 네 개의 접점(재정·금융, 시장제도 등 경제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또한 井자 분석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채택해야 할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지원 방향도 엿보인다.
북한은 자력으로 재정·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거나 재정비할 지식·경험·자본이 없다. 게다가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쪽은 해외, 한쪽은 지방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세로선(중앙정부·기관 경제)을 흔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택할 거의 유일한 해법은 지방정부 경제(세로선)에 해외 부문을 연결시켜 그들의 자력갱생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 시장경제(다소 원시적이지만)가 해외 부문과 노동력·자본·기술 등을 주고받는 ‘부분 개방’을 뜻한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면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재정·금융·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경험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여건이 충족되면 경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북한이 최근 중국·베트남의 공단을 공동 시찰하는 것은 좋은 사례다. 또한 경제이익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지방정부와의 교역을 늘려야 한다. 그들의 자력갱생을 돕는 것은 시장 시스템의 정착을 돕는 일이자 주민 생활 향상에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이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과자와 알사탕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