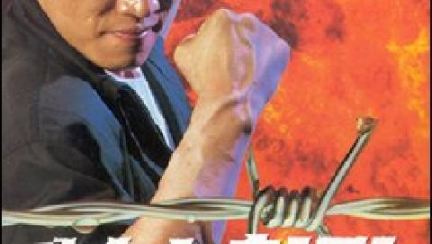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술 마시고 활을 쏘며, 고기 잡고 매와 개를 부리며, 박혁(博<5F08>)이나 즐기고 다닙니다’. 정치와 인사 등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는 사간원의 정식 제보다.
이 상소문이 지적한 박혁이라는 행위는 무엇일까.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에서는 이를 ‘바둑과 장기’라고 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진다. 실록의 다른 부분에서 장기 또는 바둑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기(碁)’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이다. 또 사간원이 양녕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서 문사들의 취미 생활이었던 바둑과 장기를 그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혁은 오히려 순 노름에 가까운 행위다. 중국 문헌의 내용을 보면 윷과 같은 나무토막 6개를 던져 12개의 말로 승부를 결정짓는 노름으로 해석된다. 제 자신의 지능과 판단력으로 승부를 짓는 바둑과 장기보다는 때맞춰 찾아올지 모르는 운에 기대어 승패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요행(僥幸)이나 바라는 노름판의 일종이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못된 꾀가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 정당화되는 노름판 가담이 과거 동양 지식사회의 덕목이 될 수는 없었을 게다. 양녕이 비록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왕의 아들.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사간원의 감시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요즘 도박이 큰 화제다. 야구선수가 사이버 도박판에 대거 뛰어들고, 축구선수들은 중국 도박사에 말려들어 부정직한 경기를 펼쳤다고 한다. 여론의 뭇매에서 비켜가기는 힘들겠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의 도박풍이 너무 거세다. 로또나 바다이야기를 찾아 늘 주머니를 여는 게 한국 사회의 일상적 풍경이다. ‘타짜’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더니 TV 드라마에서도 활개를 친다. 모두 요행에 목말라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요즘 맞은 이 위기도 그저 요행으로만 비켜갈 생각이라면 걱정이어서 꺼내 본 『조선왕조실록』의 한 대목이다. 자고로 ‘높은 지혜는 위기 때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上智不處危以僥幸)’고 했는데….
유광종 국제부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