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연 기자
신동연 기자 한나라당에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다툼의 핵심은 공천 시기와 물갈이 폭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시기를 늦추되,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교체 폭을 넓히기를 원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거꾸로다. 공천을 빨리 하자는 쪽이다. 공천 시기를 늦춰 ‘친박’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한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어땠을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재선 의원이던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맡았다. 15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가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했다.
“현역 절반은 확 바꿔보라는 게 국민 요구”
김 지사는 4일 저녁 수원에 있는 도지사 공관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를 하면서 “공천심사위를 지금 구성해도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갈이 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반은 확 바꿔보라는 게 국민의 생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시기는 박 전 대표 진영, 물갈이 폭은 이명박 당선인 진영의 주장에 좀 더 가깝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년 전 공천심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수첩을 펼쳐 보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년 전 공천심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수첩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는 4년 전 공천 과정을 기록한 수첩 5권을 들고 나왔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이따금 수첩을 뒤적였다. 인터뷰를 하는 70분 동안 그는 당·청(당과 청와대) 분리와 당내 모임 해체 문제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번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외줄을 타는 심정”이라고 말하셨는데요.
“그전까지는 ‘돈 공천’ ‘쪽지 공천’이었어요. 위에서 쪽지 내려오면 받아서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여당은 청와대, 야당은 당 대표가 (사실상) 결정했죠. 저는 처음부터 그런 공천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엔 그런 문제가 일절 없었다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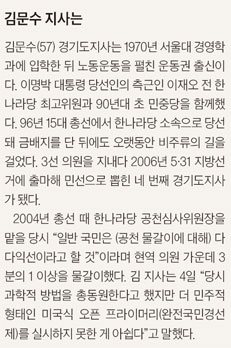
“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문제로 어려웠어요. (당 지도부가) 제게 맡긴 이유도 돈 받아먹을 사람은 아니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도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까지 돈을 가져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억∼2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원…. 진짜 독한 맘 먹고 막아냈습니다. 최병렬 당시 대표까지 (공천이) 날아갔으니 쪽지 공천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는데, 한나라당 공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치권에 일정한 세대교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선 우리가 차떼기와 탄핵 역풍 때문에 몰려서 (물갈이가) 됐다면, 이번엔 10년 만에 시대가 바뀐 것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널리 인재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지난 번보다 대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갈이 폭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해야 한다기보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야 시대 추세에 맞는 것 아닌가요.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덜 하면 (한나라당이) ‘배가 부르구나’ ‘너무 안이하구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구나’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새로운 인물들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선 문호를 넓혀야죠. 야당일 때는 아무리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얘기가 다 됐는데 5∼6명이 막판에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공천 희망자가) 머리 터지게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앉아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먹자’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공천 시기를 놓고도 갈등이 심한데요.
“공천이란 게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천심사위원끼리) 모여서 방망이만 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죠. 공천심사위 구성은 지금도 빠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해야죠. (결과) 발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천심사위 구성을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적정한 교체 비율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 참 말씀드리기 뭣한데….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보는 비율과 그냥 국회에만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너무 대폭이라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너무 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정권을 뭐 이렇게 (운영)하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힘만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세력이 연합해서 됐죠. (한나라당 외) 나머지 연합했던 세력이 ‘기껏 대통령 만들어 줬더니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당선인이 당내 다수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들어보니까 답답해요.”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태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라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작심한 듯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확 한번 바꿔 봐라, 적어도 절반은 확 바꿔 봐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뷰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영남이나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같은 이른바 한나라당 ‘안방’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는 여론 조사, 상대방과의 가상 대결, 지역구 평판이 다 좋았지만 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누구를 공천해도) 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르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대중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입니다. 수도권 접전지는 (물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해보면 사람도 별로 없고…. 안방 지역은 세게 가야죠.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뤄내야죠. 그래야만 뭔가 새 피가 돌 거예요.”
-최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중진 의원들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의원의 경우 ‘역시 김용갑답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거죠.”
-대략 몇 분이나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그건 제가 국회에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 공천심사위원장이 정해지고, 또 공천권을 가진 사람의 의중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2004년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위해선 다른 팀이 꾸려졌는데요.
“원래 (공천심사위가) 모든 공천 과정을 담당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례대표 공천을 못했어요. 표를 다 짜놓고 제가 떨려나 버렸어요. 당 지도부가 처음엔 맡겼다가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같은 분은 내심 경제관료 몫으로 공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지나친 당·정 분리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정 분리보다는 당과 청와대의 분리죠. 당·청에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내각제는 반대합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잉 권력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삼엄한 경호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차단돼 있고…. 모든 대통령의 불행의 원인이 여기 있지, 당·청이 분리돼서 불행해진 것은 아니란 거죠.”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옛 민주당이)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지, 꼭 어떻게 자기 말만 듣습니까. 안 되면서도 또 되고…. 이게 청와대와 여당 관계 아닙니까.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이재오 의원이 당내에서 활동하던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이하 발전연)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발전연 회원 중에는 당내 경선 때 이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해체가 진짜 됐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전날 (이 의원과) 만났는데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해체한다고 했더군요. 저도 거기 창립 멤버인데, 해체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된다?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변함없이 꿋꿋하게 가야 될 게 있고, 때에 맞춰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정한 연구 그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계파성이 너무 크면 그것은 경계해야죠. 그러나 이걸 아주 죄악시해서 말살하기 위해 아예 싹 초가삼간 태우고 집을 또 짓자고 나오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만난 사람= 이양수 정치·국제 에디터
정리=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