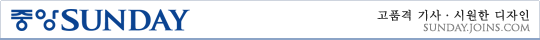마이클 조던이 없었다면 그들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 프로농구(NBA) 1980~90년대를 풍미한 뉴욕 닉스의 킹콩 센터 패트릭 유잉과 존 스탁스는 챔피언 반지 몇 개를 끼고 있었을 것이다. 역대 최고 슈터인 레지 밀러도 우승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게다. 유타 재즈의 어시스트맨 존 스탁턴과 메일맨 칼 말론도 한두 번쯤 우승했을 테고. 타이거 우즈가 없었다면 이 훌륭한 골퍼들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마흔이 다 되도록 황태자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어니 엘스는 지금 골프 천하를 지휘하는 황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왼손의 마법사인 필 미켈슨이 잭 니클로스의 메이저대회 18승 기록을 깨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피지의 거친 러프에서 일어난 비제이 싱이 지구상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됐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불세출의 스타 타이거 우즈와 동시대를 산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우즈 때문에 골프 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과실을 그들도 따기는 했지만 그 돈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은 충분했다. 우두머리 수컷 옆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배를 두드리기엔 이 수컷들의 자존심은 너무 강하다.
그들이 싱가포르에 한꺼번에 모였다.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영국의 은행 바클레이스가 싱가포르 오픈의 스폰서가 되면서 이들을 모았다. 상금만 400만 달러에 초청료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골프계의 빅4 중 타이거 우즈를 제외하고 이들 셋이 함께 모인 경우는 거의 없다. 메이저 대회 등 굵직한 대회는 우즈를 포함, 네 선수가 모두 나간다. 우즈가 나가지 않는 시시한 대회는 자존심 센 미켈슨도 안 나간다. 싱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개근하지만 어니 엘스는 미국 PGA 투어보다 유러피언 투어에 더 마음이 가 있다.
결국 우즈 없이 세 선수가 모일 일이 없었다. 이 2인자들이 오랫동안 꿈꿔왔을 완벽한 세상, 바로 타이거 없는 세상에서 만난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엘스는 배탈로 고생을 하고 있고, 미켈슨은 샌디에이고 집 근처에 큰불이 나서 마음이 편치 않으며, 싱은 과거 자신을 제명시킨 아시안투어 본부에 왔는데도 말이다. 우즈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즈에 대한 울분으로 말하면 엘스가 최고다. 그는 호랑이 밥이다. 특히 1998년 당시로선 풋내기인 우즈에게 너무 아픈 충격을 맛봤다.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최종 라운드 8타 차로 앞서 가다가 역전당했다. 이 정도라면 골퍼에겐 충격과 공포다. 그의 심리치료사는 “당신이 우즈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득해도 그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우즈가 우승한 대회에서 2등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엘스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들러리로 보지는 말아달라”며 “이제 무릎 부상에서 회복했고 우승도 했으니 다시 넘버 1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웃음 속에서도 타이거 스트레스는 살아 있는 듯했다.
싱과 미켈슨은 우즈에게 고개를 숙이는 엘스와는 다르다. 매우 경쟁적인 선수들이다.
싱은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을 때 캐디에게 ‘타이거가 누군데’라는 티셔츠를 입고 나오게 했다. 싱은 또 싱가포르 오픈 인터뷰에서 세계 랭킹 1위에 대한 재도전을 천명했다. “올해 골프 스윙을 바꾸고 있어서 성적이 나빴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인터뷰에서 자신에 찬 얼굴로 “50세까지 이런 경쟁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알려진 대로 싱은 연습벌레다. 최경주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연습벌레인 싱을 따라 하려다 사흘 만에 몸살이 났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항우장사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싱은 우즈 시대의 전반기를 약간 드라마틱하게 해준 조연으로 선수 생활을 마칠 것이다.
미켈슨도 타이거에 대해 가끔 도발한다. 2005년 포드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동반 라운드한 우즈에게 지고 나서 따귀를 맞은 것 같다고 펄펄 뛰었으며 올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복수했다. 라이더컵에서는 우즈와 함께 한 팀으로 나갔지만 우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올해는 우즈의 스승이었던 부치 하먼을 모셔가면서 또다시 우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한번 싸워보자고 계속 나서는 도전자 같다.
그러나 필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필드 밖에서는 너무 가족적이고, 하얀 피부와
환한 웃음으로 주류 미디어와 팬들의 과장된 환호를 받는 그가 아무도 없는 정글에서 타이거를 만나면 승산은 적다. 대중이 좋아한 아널드 파머는 잭 니클로스와 혈전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기록으로 봐서 미켈슨은 우즈의 상대가 아니다. 좋은 스파링 파트너 혹은 연기력보다는 외모가 뛰어났던 조연으로 그는 남을 것이다.
사실 자신의 세계를 호시탐탐 노렸던 이 재능 넘치는 도전자들에게 우즈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 전통주의자인 그가 작은 헤드의 드라이버를 버리고 대형 드라이버를 들고 나온 것도 자신보다 덩치가 큰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다 큰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진압은 끝났다.
이들이 세계랭킹 1위가 되기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들 중 한 명이 우즈처럼 두 대회에서 한 대회 정도 우승하고 우즈가 컷 탈락을 밥 먹듯 한다면 2년 정도 지나 역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어 타이거 우즈 시대의 들러리로서 골프 인생을 마쳐야 할 운명이다.
결국 싱가포르 오픈에서 누가 우승하든 그것은 타이거 없는 세상에서의 우승이며, 완벽하지 않은 가짜 세상일 뿐이다. 그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이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벽을 보며 마음속으로 통곡을 할지도 모른다.
싱가포르=성호준 기자 karis@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