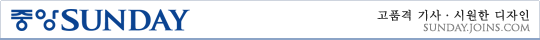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우라늄 2.7kg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 나섰고 연구원 측도 자체 대책반을 만들어 석 달 전에 분실한 우라늄을 찾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우라늄 분실·수색 과정을 추적했다. 6일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작동(棟) 1층 양자광학연구센터 레이저실험실. 다음날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 사찰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작업을 벌이던 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탁자 위에 있던 사찰 대상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터리 크기 정도의 박스에는 천연 우라늄 1.9kg, 감손 우라늄(농축한 뒤 나오는 부스러기) 0.8kg, 10% 농축 우라늄 0.2g이 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실험실을 개조하는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른 연구실에 잠시 옮겨뒀을 것으로 보고 인근 건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종적을 찾지 못하고 오후 5시 박창규 연구원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연구원은 발칵 뒤집혔고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분실물의 ‘이력’ 때문이었다. 3년 동안 IAEA 사찰 받던 우라늄 2004년 9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2000년 원자력연구소(원자력연구원의 전신) 핵연료 실험 도중 우라늄 0.2g 농축했다’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2000년 1~2월 레이저를 이용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을 정부가 자진 신고해 IAEA가 특별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은 현재까지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 당시 우라늄 농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일반적으로 90%로 농축된 우라늄 15kg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농축 양이 적었지만 매우 미묘한 사안이었다. IAEA는 특별사찰 뒤 실험에 사용된 우라늄을 밀봉하고(2005년 6월 해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해 9~12월 여섯 차례나 사찰팀을 파견해 감시에 나섰다. 그러나 농축실험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연구자의 호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소명이 입증되면서 2005년부터 사찰 횟수는 한 차례로 줄었다. 이번에 분실된 우라늄 중에는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로 그 우라늄이 포함돼 있다. “사찰 없었다면 분실 몰랐을 것”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우라늄 2.7kg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 나섰고 연구원 측도 자체 대책반을 만들어 석 달 전에 분실한 우라늄을 찾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우라늄 분실·수색 과정을 추적했다. 6일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작동(棟) 1층 양자광학연구센터 레이저실험실. 다음날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 사찰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작업을 벌이던 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탁자 위에 있던 사찰 대상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터리 크기 정도의 박스에는 천연 우라늄 1.9kg, 감손 우라늄(농축한 뒤 나오는 부스러기) 0.8kg, 10% 농축 우라늄 0.2g이 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실험실을 개조하는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른 연구실에 잠시 옮겨뒀을 것으로 보고 인근 건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종적을 찾지 못하고 오후 5시 박창규 연구원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연구원은 발칵 뒤집혔고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분실물의 ‘이력’ 때문이었다. 3년 동안 IAEA 사찰 받던 우라늄 2004년 9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2000년 원자력연구소(원자력연구원의 전신) 핵연료 실험 도중 우라늄 0.2g 농축했다’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2000년 1~2월 레이저를 이용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을 정부가 자진 신고해 IAEA가 특별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은 현재까지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 당시 우라늄 농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일반적으로 90%로 농축된 우라늄 15kg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농축 양이 적었지만 매우 미묘한 사안이었다. IAEA는 특별사찰 뒤 실험에 사용된 우라늄을 밀봉하고(2005년 6월 해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해 9~12월 여섯 차례나 사찰팀을 파견해 감시에 나섰다. 그러나 농축실험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연구자의 호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소명이 입증되면서 2005년부터 사찰 횟수는 한 차례로 줄었다. 이번에 분실된 우라늄 중에는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로 그 우라늄이 포함돼 있다. “사찰 없었다면 분실 몰랐을 것”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이 우라늄이 소각돼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한 매립장에서 시추공을 통해 채취한 시료를 살펴보고 있다. 작은 사진은 우라늄이 담겨 있던 박스로, 신탄진의 폐기물 운반차량 차고지에서 발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이런 상태에서 5월 17일 실험실 공사를 하던 인부가 일반 폐기물로 보고 박스를 연구원의 쓰레기집하장에 내놓았다. 박스가 연구실을 나갈 때나 운반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다행히 대책반은 신탄진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고지에서 박스와 그 안에 있던 구리로 만든 도가니(레이저 시설을 가열하는 장치), 볼트 4개를 찾아냈다.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류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비닐 봉지에 싸여 있던 우라늄은 없었다. 5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른 쓰레기 1480kg과 함께 태워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 측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13일 소각장 주변 5곳의 우라늄 농도를 측정했다. 그러나 채취한 소각 찌꺼기의 농도는 0.55~1.28ppm으로 우리나라 평균 우라늄 농도인 4ppm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소각장 부근 매립장에 시추공 100여 개를 뚫었다. 지름 3cm의 파이프를 지하 7.5m까지 내려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연구원 측은 결국 ‘회수 불능’ 결론을 내렸다. “워낙 미량인 데다 폐기물 매립장은 넓은 데 매립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고 대책반 관계자는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주에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체·환경에 부작용 없어 IAEA가 어떤 판정을 내릴까. 연구원 측은 ‘우발적 손실’(accidental loss)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우라늄과 천연우라늄보다 핵물질 함량이 낮은 감손 우라늄은 소각되지 않고 자연상태에 있어도 인체나 환경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토양 330㎡(약 100평)에 포함돼 있는 우라늄 정도이기 때문이다. 농축우라늄 0.2g 역시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천연우라늄은 1t, 감손우라늄은 2t, 10% 농축우라늄은 100kg 정도 돼야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핵물질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것만은 분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창규 원자력연구원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r 중앙SUNDAY 구독신청
![[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