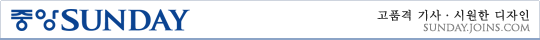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주민등록 자료는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삶의 동선(動線)을 보여준다. 또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행정기관은 이 자료가 탈·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주민등록 자료는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삶의 동선(動線)을 보여준다. 또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행정기관은 이 자료가 탈·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지난 해 전국에서 발급된 등·초본은 9300만 건이 넘었다. 신동연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동사무소를 찾았다. 어떻게 주민등록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 주민등록 초본요? 허위로 용도를 꾸며 발급받아 가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우리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발급해주는 것뿐이거든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걸핏하면 동사무소만 욕을 먹는다”고 억울해하며 신용정보회사로 화살을 돌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 규칙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한 장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확인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과 채무액이 기재돼 있어요. 동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인감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대통령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도 창구에선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게 누구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이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하루 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법원 제출용’ 초본 발급이 많은 월초에는 하루 500~600건을 훌쩍 넘긴다.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한 번에 70~80건을 무더기로 떼 간다. “다른 민원업무와 겹칠 때는 일과 후에 발급해놓고 다음 날 오전 찾아가도록 하지요. 사실확인서를 보면 휴대전화 요금 2만~3만원 연체된 것을 받기 위해 초본을 떼 가요. 심하다 싶지만, 동사무소 입장에선 발급을 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카드 등 금융빚 연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초본 발급이 일상적인 일이 됐다. 상당수 신용정보회사는 자체적으로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정도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한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된 과정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33)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광주광역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초본 87건을 뗀 뒤 건당 3만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당시 확인서의 채무 기일과 변제금액 등이 모두 동일한 데다 확인서에 적힌 주소와 초본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발급됐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그 동사무소에서 자주 초본을 뗐고, 안면이 있는 동사무소 직원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초본들은 중국으로 보내져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33개 가운데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떼볼 수 있는 곳은 27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탈·불법적인 발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금융검사국 최건호 신용정보대부업팀장은 “신용정보회사를 검사할 때 발급대장을 확인하지만, 건수가 워낙 많은 탓에 전수(全數) 검사는 어렵다”며 “위법이 일반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통신채권(휴대전화 요금 연체) 액수가 적다고 해도 신용정보회사에선 연체자의 최종 주소지를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겠느냐”며 “액수 등을 이유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권금융회사·신탁회사·유동화전문회사·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도 법인 인감이나 사무실 직인이 찍힌 확인서만 있으면 초본을 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맡으면 원고나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하다”며 “별 거리낌 없이 초본을 떼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급 불감증’ 속에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는 9333만 건으로 세대당 5.1건꼴이다. 행정기관 사이의 주민등록정보 공동 이용 확대로 등·초본 제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최근 들어선 공무원·공익근무요원 같은 ‘내부자’들까지 주민등록 자료 유출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본 266건을 몰래 발급해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에선 동사무소 직원이 동료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로 등·초본 15만 건을 무단 발급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부인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다.
사기 행각에 쓰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의사 김모씨 등의 신분증을 위조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뗀 뒤 김씨의 땅 148평을 담보로 7억5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사기범 일당 5명이 구속됐다. 위임장에 가짜 도장을 찍은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1만여 건을 발급받아 건당 5000~9500원에 넘긴 인터넷 대행업자가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김성한 사무관은 “등·초본 발급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민원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무소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 용도로 유출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행정기관들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민등록 자료 열람·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발급 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개별 법률에 관련 조항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 중앙SUNDAY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