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입성을 위한 ‘머니 게임’이 불붙었다. 올 초를 기점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의 닻이 오른 뒤 누가 대통령 선거자금을 많이 긁어 모았는지 첫 분기성적표(1~3월)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같은 대권 주자들은 ‘초반 전심(錢心)이 막판 민심(民心)을 대변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유명인을 동원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다.
헤지펀드까지 가세한 가운데 일본 도요타도 정치자금 제공할 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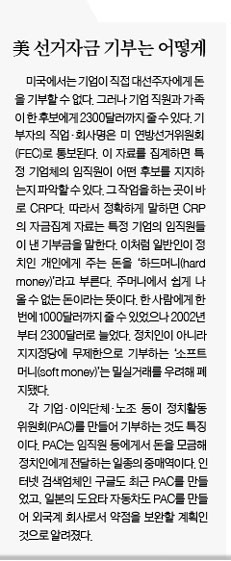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비싼 대선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돈줄을 쥔 기업으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무대의 주연배우는 거물 정치인이지만 조명을 비추는 건 기업이라는 얘기다. 계산기 두드리는 데 한창인 기업들은 과연 누구에게 돈벼락을 내릴까. 돈과 정치가 얽히고설킨 ‘미국 대선의 경제학’을 들여다봤다.
■법률회사ㆍ투자은행이 곳간 열쇠 쥐었다
대선주자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곳은 법률업계다. 1분기에 공화당ㆍ민주당의 대선주자 18명에게 총 1460만 달러를 기부했다. 두 번째 큰손은 증권ㆍ투자은행들로 860만 달러를 냈다. 이는 책임정치센터(CRPㆍ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라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관이 집계한 결과다. CRP는 정부를 대신해 정치자금을 추적하고 백서(白書)를 내는 곳이다. CRP의 셰일라 크룸홀츠 사무국장은 “대선주자들이 몇 천만 달러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 목소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선 특히 소수의 큰손들이 지갑을 열어 초반 표심(票心)을 교통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투자은행 업계의 왕자인 골드먼삭스가 1위에 올랐다. 임직원들이 낸 돈이 50만 달러에 달했다. 씨티그룹ㆍUBS아메리카ㆍ크레디스위스 등 금융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법률회사에선 시들리 오스틴의 임직원들이 19만 달러를 제공해 업계 수위(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돈은 역시 유력주자에게 몰렸다.
예를 들어 미 최초로 ‘부부 대통령’에 도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은 1분기 모금액이 총 3605만 달러로 1위였다. 그런데 자금을 많이 기부한 상위 5개사 중 3개가 투자은행이었다. 씨티그룹이 10만1000달러를 냈고 모건스탠리ㆍ골드먼삭스도 명함을 내밀었다. 월가는 그동안 공화당 부시 정부의 강경 외교노선 등으로 미국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 비즈니스하기가 힘들다고 푸념해왔다. 힐러리 의원이 월가의 지원사격을 계속 이끌어내면 대선고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기업들이 지갑 여는 까닭은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원하는 반대급부는 뭘까.
미국 대선 기부금은 ‘법규의 가격’으로 통한다. 기업이 유력 대선 주자에 미리 돈을 대주고, 당선 이후 법과 규정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거래다.
텍사스 석유재벌들이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돈을 몰아주고 석유 시추 규제 등을 푼 것이 대표적이다. 씨티그룹은 1998년 로비를 통해 은행의 겸업을 막는 연방법률을 무산시켜 보험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이처럼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인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나름의 틀을 만들어 기업과 정치가 ‘공생(共生)’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보험의 보장자산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골드먼삭스가 2000년 이후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많이 주는 것도 회장을 지낸 존 코진이 뉴저지 상원의원을 거쳐 주지사로 있기 때문이다.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은 힐러리 의원을 바짝 뒤쫓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올 1분기 기부액의 절반을 몰아줬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 의원은 아내를 시카고의 시들리 오스틴 회사에서 만났다. 특히 CRP는 아직까지 유력 후보 구도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은 연줄에 의존한 모금이 주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모르몬교와의 인연으로 매리어트호텔에서 거액(11만 달러)을 받는 등 총모금액이 2434만 달러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을 제치고 공화당 주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여러 보험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기본이다. 날고 기는 기업도 장래의 대통령 당선자를 족집게처럼 찍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힐러리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기부액 상위 5개사 목록에 씨티그룹이 나란히 올랐다.
■실력자로 부상하는 헤지펀드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존 에드워즈 민주당전 상원의원은 2년 전 당내 대선후보 선거에서 “미국엔 두 개의 다른 경제주체가 있다. 하나는 부유한 내부거래자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모두다”라고 일침을 놨다. 내부거래자는 헤지펀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넉 달 뒤 그는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헤지펀드의 컨설턴트가 됐다. 그리고 올 1분기 포트리스 임직원과 가족 100명이 그에게 17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에게 기부한 기업 중에서 1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선 자산이 1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 업계가 본격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떠들썩하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주요 자금책인 폴 싱어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펀드에서 10만 달러를 받았다. 오바마 의원도 역외 헤지펀드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오린 크레이머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주요 모금책으로 포섭했다. 돈 앞에선 움츠러들고 말을 바꾸는 정치의 생리는 워싱턴의 ‘K 스트리트(로비회사 밀집지역)’에서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