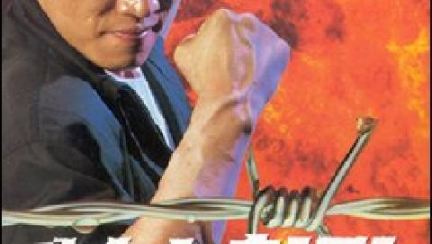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시모집의 경우 100~150명의 교수가 하루에 1인당 50~60명 분을 채점한다. 한 명의 답안 채점에 10~15분 정도 걸려 중노동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3~4인 1조로 수험생 한 명의 답안지를 교차 체크한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하루에 많은 분량을 읽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채점에 참여했던 또 다른 교수는 "시험의 평가 목적이 철학적 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글쓰기 실력을 보자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 털어놨다.
대입 논술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대입 논술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단순 작문'형태로 도입됐지만 2008학년도에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되면서 비중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논술 실시 대학도 45개교로 늘어난다. 학부모.학생.교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우왕좌왕이다.
고2 아들을 둔 박모(49)씨는 "이름도 생소한 통합논술이 확대된다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설 학원은 자기들한테 배워야 대학에 간다고 하고, 대학 측은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45.고2 여학생 아버지)씨도 "교수들이 무슨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건지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다.
논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강 건너 불 보듯'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계적인 출제와 채점을 반복하면서 '때가 되면 하는 행사'로 치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10년 출제해도 노하우가 없다=사립대 출제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대부분의 교수가 출제.채점을 부담스러워해 한 번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술이 형태를 달리해 가며 10여 년간이나 출제돼 왔지만 그에 대한 대학의 노하우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동노 교수는 "교수 10여 명이 고교 교과서와 참고서 30여 가지를 다 점검한 후에 문제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쉽게 내면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는 게 어렵고, 어렵게 내면 고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적정선을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 어려워야 명문 취급=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하는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가 쉬우면 '별 볼일 없는 대학'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출제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교수들도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관리처장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시시콜콜 간섭해 그걸 피해가느라 그렇다"고 말했다.
◆ 대학도 노력 한다=서울대는 최근 고교 교사 800명에게 논술 연수를 하기로 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고교 교사들과 함께 '논술 협의회'를 만들어 논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연세대의 경우 매년 12월 1학년 재학생들을 선발해 모의 논술시험을 치르는 등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고교 입시관계자협의회' 회장인 박제남 인하대 교수는 "그동안 대학들이 고교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논술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대학과 고교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기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양영유.강홍준.이원진.김은하.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