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 결정된 뒤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 들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은 유사 시 나토에 파견되는 자국 전력의 1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원국이 지휘 통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두루뭉술한 용어'의 구사나 '핵심 내용의 삭제' 등을 통해 진상과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땐 수백조원대 비용 부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초반 평시.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가 한.미 간에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냉전 종식에 따라 2000년대엔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그 결과 평시작전통제권부터 한국군이 단독 행사키로 92년 합의됐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느냐다. 당시 군내 일각에서 몇 가지 환수 시점을 상정하고 논의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마저 93년 북한 핵 문제가 터지자 중단됐다. 이즈음 추진됐던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계획 중 2단계가 중단된 것이 바로 이런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때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식이다. 문민정부에서 이행된 것은 평시작전통제권에 국한됐음에도 이를 '작전통제권'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린 것이다. 마치 전작권도 포함된 것처럼 말이다.
송 실장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의 주장에는 공격을 받은 나토 회원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빠졌다. 전쟁의 1차적 당사자가 된 그 국가의 전작권은 나토 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만 거론한 것이다.
이 정권이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전작권을 갖고 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지다. '전작권'은 원래 한국전 이후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준 것이다. 현재의 전작권도 한.미 대통령의 공동 지휘를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어 '공동 행사'가 적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사안이 명백함에도 이 정권은 엉뚱한 논리만 고집하고,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따른 수백조원대의 비용 부담으로 겪게 될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군 전력을 보다 강화한 뒤 논의해도 될 것을 왜 '몇 년 후'라는 가정에 입각해 추진하느냐'는 국민의 우려도 오불관언이다. 오로지 이념적 코드인 '자주'를 한껏 고양시키는 것을 이 정권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기세인 것이다.
미군 철수로 국력 추락한 필리핀
이런 점에서 방한한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한국의 몇몇 정치가는) 곤란한 처지가 되고 나서야 우리한테 돈과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미군을 철수해 국력이 추락한 필리핀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와해상을 정말 실감나게 전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작권 문제는 예정대로 한.미 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노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가. 정부는 더 이상 설득력 없는 논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라의 현실을 놓고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하이드 의원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 바로잡습니다
8월 12일자 26면 '억지와 고집이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사설 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 결정된 뒤… "에서 '전작권'은 '작전통제권'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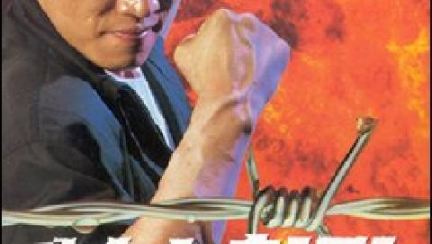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