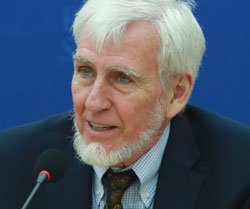
역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뉜다. 2012년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일본 교토대 교수는 ‘깜짝 스타’였다. 연구성과를 낸지 불과 6년 만에 상을 탔다. 반면 지난해 물리학상을 받은 피터 힉스 영국 에든버러대 명예교수는 대기만성형이다. 논문을 발표한 지 근 반세기 만에 상을 받았다.
올해 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오키프(75·사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후자에 속한다. 1971년 논문을 낸 지 43년 만에 상을 받았다. 그나마 “원래 논문은 3페이지짜리였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연구소를 떠나게 돼 급히 학술지(브레인 리서치)에 투고했는데 퇴짜를 맞았었다”고 회고했다.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IBS)·영국왕립학회 공동 학술회의장에서다.
세계적 석학이 된 지금은 숨기고 싶은 비사(秘史)일 수도 있건만, 오키프는 당당했다. “기존 지식에 반하는 (혁신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학계가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오키프의 업적은 공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뇌 속 ‘장소 세포(place cell)’의 존재를 처음 규명한 것이다. 뇌 세포가 손상돼 항상 다니던 길까지 잃어버리곤 하는 치매환자 치료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과학 연구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이 중요하지만 연구가 계속 진행될수록 (주위의)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60년대 개발된 트랜지스터 기술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작고 가벼운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덕에 살아있는 쥐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생생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키프는 ‘인류가 언제쯤 뇌의 신비를 다 밝힐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노벨상 발표 직전 만났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오바마에게 “미 정부가 뇌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언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곧 다가올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것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오키프는 이번에 영국왕립학회 회원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김한별 기자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