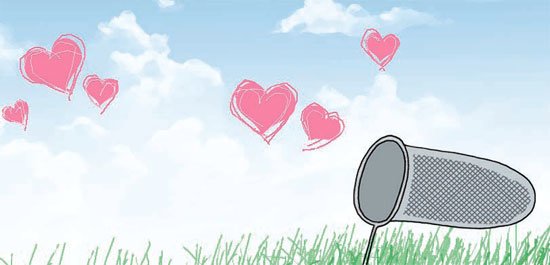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혜미
김혜미사회부문 기자
상대의 시선이 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향했다. “결혼반지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한다.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어김없이 나오는 다음 질문. “어머 어쩜, 행복하죠?” 어쩌면 좋을까. 나는 살짝 서글픈 눈으로 웃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장면이다.
내가 그린 결혼 그림은 이게 아니었다. 아침식사로 7첩 반상은 못 챙길지언정 달걀프라이와 빵, 과일주스. 이 정도는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웬걸. 바나나 하나 입에 물고 나가기도 버겁다. 평일 아침의 엘리베이터, 부스스한 머리와 구겨진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이게 아닌데’.
저녁이라고 다르지 않다. 꿈꾸던 신혼의 저녁은 동네 마트에서 시작한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로 마무리. 이것도 웬걸. 마트 문 닫기 전에 들어온 날이 손에 꼽힌다. 큰 맘 먹고 구입한 접시들은 한낱 관상용이 됐다. 토요일 아침의 엘리베이터, 상해 버린 야채를 가득 담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서 있다. ‘이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신랑이 물었다. “같이 밥도 못 먹고. 퇴근해선 씻고 자기 바쁘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이 다다닥 튀어나왔다. 울컥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 말야.”
나의 ‘행복론’은 이해받지 못했다. “둘 다 일을 하잖아. 출퇴근이 여유 있는 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무심한 대답에 슬픔이 더욱 복받쳤다. “다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가 받아쳤다. “누가?”
잠시 말이 끊겼다. 누구였지. 엄청 많았는데. “내 페이스북 친구들이….” 정말 그랬다. 내가 바나나를 먹는 그 시각, 페이스북에는 신랑이 차려준 아침을 먹는 대학 친구 A의 사진이 올라왔다. 신랑에게 선물받은 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B도 있었다. B는 10년 넘게 얼굴 한 번 못 본 고교 동창이다. 많은 이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웃고 있는 사람들. 너도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
다음 날, 우리의 퇴근은 또 오후 10시를 넘겼다. 둘이 집 근처 산책로를 뛰기로 했다. 30분쯤 됐을까. 더운 날씨에 초췌해진 얼굴 위로 땀이 흘렀다. “아, 행복하다.” 그가 행복을 말했다. 사진을 찍어 남길 수조차 없는 이런 몰골로. 페이스북에 올려도 ‘좋아요’ 한 번 받을 수 없는 빈약한 스토리로.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줄곧 행복을 그리고 기다려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할 수 있다니. 찾아보니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행복을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했단다. 방송인 홍진경도 TV에 나와 말했다. “삶이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니 나아졌다”고. 나는 이제 행복하냐고 묻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든 남에게든.
김혜미 사회부문 기자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e66a155-7b88-4f53-bae4-abe4969cbc90.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