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르 하이얌의 무덤 인근에 있는 그의 동상(이란 니샤푸르 소재)
오마르 하이얌의 무덤 인근에 있는 그의 동상(이란 니샤푸르 소재) 
『황무지』로 유명한 T S 엘리엇(1888~1965)이 말했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밝고도 맛있고도 고통스러운 색깔로 칠한 세상이 보였다”고. 오마르 하이얌(1048~1131년께)의 시를 읽고 나서 한 말이다. (세계가 달리 보인 것까지는 좋았으나 하이얌의 ‘언어적 마수(魔手)’에서 벗어나느라 엘리엇이 곤욕을 치렀다는 후문이 있다.)
<31> 오마르 하이얌 『루바이야트』
하이얌(‘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직업에서 나옴)은 12세기 페르시아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수학자였다. 산문은 남긴 게 없지만 최소 750, 1200~2000편의 4행시(quatrain)를 썼다.
영국 시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1809~83)가 그를 발굴해 『오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야트』(1859)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시집을 펴냈다. 피츠제럴드의 영문본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재구성이다. ‘창작번역(transcreation)’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원래는 무순(無順)인 『루바이야트』를 하루 일과에 맞춰 스토리를 만들었다.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야트』는 영미권에서 시를 대중화시켰다. 영시에 대혁신의 태풍을 몰고 왔다. 원료가 페르시아어로 된 시라는 게 얄궂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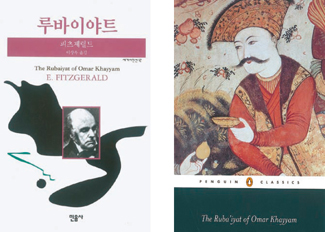 『루바이야트』의 한글판(왼쪽·서울대 이상옥 명예교수 옮김)과 영문판 표지.
『루바이야트』의 한글판(왼쪽·서울대 이상옥 명예교수 옮김)과 영문판 표지. 비록 지금은 잊혀졌지만-영미권에서는 50세 이상만 안다-『루바이야트』는 영어로 발간된 시집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사실이다. 믿거나 말거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국 엘리트 장병들은 『루바이야트』를 암송하며 행군했다. 마크 트웨인, 랠프 월도 에머슨, 에즈라 파운드 같은 대문호들도 『루바이야트』에 흠뻑 빠졌다. 『루바이야트』를 음악으로 해석한 작곡가가 100명, 그림을 그린 화가가 150명이 넘는다.
『루바이야트』에 나오는 “포도주 한 단지, 빵 한 조각, 그리고 그대”, “부귀를 좇으라. 명예란 아무려면 어떠리” “한때 만발한 꽃은 영원히 죽는다”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써나가다” 같은 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숙어였다.
서울대 이상옥 교수가 시조풍으로 재해석
광팬이 있으면 안티도 있는 법.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중이 좋아하면 비평가들의 사시(邪視)를 피하기 힘들다. 미국 기독교의 절제운동가들은 『루바이야트』가 ‘술주정뱅이들의 성경’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자유사상가, 쾌락주의자(hedonist)의 성경이라고도 불린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 서울대 이상옥 명예교수의 번역으로 몇 편을 감상해보자. 페르시아 원문보다 유려한 피츠제럴드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상옥 교수의 우리말 번역은 원본의 뜻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의역이다. 하이얌의 시가 우리 시조(時調)로 거듭났다.
젊은 날 성현들을 찾아다니며
이것 저것 높은 말씀 들어봤건만
언제나 같은 문을 출입했을 뿐
나 자신 깨우친 것 하나 없었네
천국이 별것인가, 욕망 충족의 환영이요
지옥이 별것인가, 어둠 속에 던져진
불붙은 영혼의 그림자일 뿐, 우리 모두
그 어둠에서 나와 다시 거기로 돌아갈 몸
세속의 영화 위해 한숨 짓는 이,
예언자의 천국 바라 한숨 짓는 이,
귀한 것은 현금이니 외상 약속 사양하세
먼 곳의 북소리에 귀기울여 무엇하리
황금 싸라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물쓰듯 바람에 날려 보낸 사람이나
황금의 대지로 화신할 수 없는
죽어 묻히면 그 아무도 파보지 않으리
살아나는 풀잎이 뒤엎은 강둑,
그 위에서 노닐 때에는 조심을 하오.
그 옛날 귀한 이의 입술 위에서
몰래 핀 풀인지 누가 알리요
시집 한 권, 빵 한 덩이, 포도주 한 병,
나무 그늘 아래서 벗 삼으리
그대 또한 내 곁에서 노래를 하니
오, 황야도 천국이나 다름없어라
Here with a Loaf of Bread beneath the Bough,
A Flask of Wine, a Book of Verse-and Thou
Beside me singing in the Wilderness-
And Wilderness is Paradise enow.
(이상옥 교수의 우리말 번역본에는 피츠제럴드 영역본도 함께 나와 있다. 두 번역을 비교하다 보면 새롭게 얻는 게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가(雅歌)’는 너무 야해 설교·강론의 주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남녀 간의 연애를 진하게 찬양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아가’가 성경에서 살아 남은 비결 중 하나는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 표현했다는 신통(神通)한 해석 덕분이다. 술을 멀리하는 경건주의 색채가 강한 이슬람권에서 『루바이야트』가 생존한 사연도 구조가 비슷하다. 술을 상징으로 삼아 ‘하느님에 취한 인간’을 노래했다는 해석 덕분이다.
하이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성격이나 믿음을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가 무신론자였는지 불가지론자였는지 플라톤주의자였는지 정통파 무슬림였는지 수피스트(sufist)였는지… 언왕설래(言往說來)가 있을 뿐 알 수 없다. 어쩌면 하이얌은 무신론자에서 수피스트까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초월했는지 모른다. 16세기 서양의 그레고리우스력보다 훨씬 정확한 페르시아의 달력 개혁 작업에 참가한 것으로 유명한데 확증은 없다.
하이얌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는데, 당시는 천문학이 점성술이고 점성술이 천문학인 시대였다. 하이얌 자신은 점성술을 믿지 않았지만 최고 권력자인 술탄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달려가 미래를 예언해 줬다고 전한다.
한잔 술 마시며 인생 본모습 받아들이라
이슬람권에서 하이얌은 철학자·수학자로 명성이 높았지만 시인으로서는 평가가 별로였다. 2류나 3류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영미권에서 시성(詩聖)으로 인정받고 세계 70여 개 언어로 번역되자 그의 고향 페르시아에서도 그를 다시 보게 됐다.
피츠제럴드의 영문판 『루바이야트』를 통해 12세기 페르시아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만났다. 영문판이 나온 1859년은 본 의도와 달리 창조설에 일격을 가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해이기도 했다(샤르댕 등 많은 신학자가 진화 또한 신의 섭리 속에서 전개한다며 진화론을 포섭해버렸지만…). 『루바이야트』는 당시 영국의 시대 분위기와 딱 들어맞았다. 도시화·산업화로 풍요로움이 도처에 넘치는 수퍼파워 영국…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신(神)에 대한 회의가 만연했지만 그렇다고 신을 아예 버릴 수도 없게 하는 전통의 관성과 죽음의 공포….
『루바이야트』는 껄껄거리며 짧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시들기 전의 장미나 기울기 전 달님에 취하라고 설파했다.
『루바이야트』의 정신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학자들은 커피가 몸에 좋다고 했다가 또 나쁘다고 한다. 커피만 그런가. 인생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100번째 할아버지도 고민했다. 확답·확신이 없다고 인생을 막 살 것인가. 대충 살 것인가. 허비할 것인가. 아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하루 좋은 벗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면 큰 화는 없다는 게 『루바이야트』의 권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