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사태가 ‘2막’에 접어들었다.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룹의 신구(新舊) 핵심으로 평가되는 두 회사의 법정관리행으로 그룹 해체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법정관리로 가면 피해가 커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 하청업체와의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동양그룹은 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각각 춘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신청한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에 이어 비금융 분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모두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중추 계열사다. 1957년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시멘트 기업이다. 지금도 쌍용양회공업에 이어 업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다.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은행 돈을 많이 쓴 데다 부채비율도 200% 이내여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사정에 밝은 금융권 인사는 “시멘트는 자산이 있고 수익을 내는 회사라 법정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의아해했다.
동양 “조속한 안정 위해 불가피”
그룹 측은 불가피한 승부수라는 입장이다. 동양그룹은 이날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하다가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룹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보면 동양시멘트 역시 결코 양호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워크아웃 얘기도 은행권 대출금이 좀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소문이 돈 것일 뿐 우리가 확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갈 경우 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한 자산 매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현재현(64·사진)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개인과 협력업체를 희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법정관리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두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를 줄이지 않고 법정관리를 통해 단박에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이다. 임일성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부실 기업 대주주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해온 경험이 있어 시장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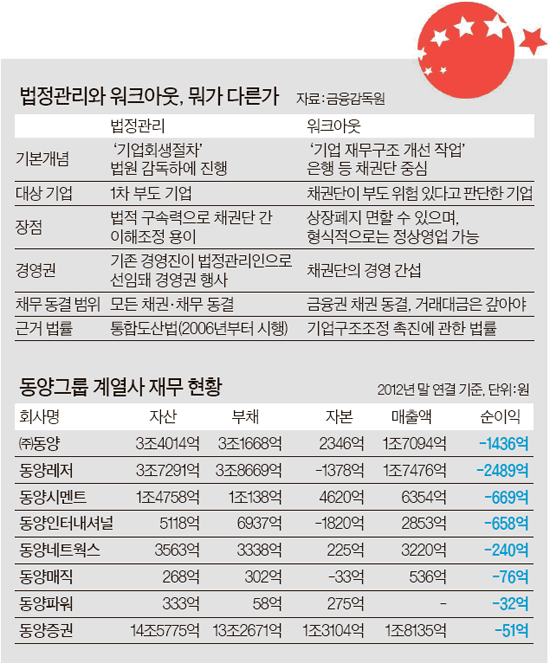
시장 “법정관리 허점 악용 의심”
동양시멘트가 전통적 핵심 계열사라면 1991년 설립된 동양네트웍스는 그룹 내 IT 전문기업이라는 위상보다는 오너 일가의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사실상 ㈜동양에 버금가는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현재현 회장의 장모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이던 1500억여원어치의 오리온 주식은 동양네트웍스에 무상 대여됐다가 최근 무상 증여됐다. 이 회사는 이 주식을 팔아 동양레저로부터 이 이사장이 아끼는 부동산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과 경기도 안성시 골프장 등 부동산들을 사들였다. 지난 6월에는 현 회장의 장남인 승담(33)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네트웍스에 자산 몰아넣기 의혹
동양네트웍스는 또 급전 마련을 위해 동양매직을 매도하면서 매수 의향자인 KTB 파트너스에쿼티(PE) 컨소시엄에 600억원을 투자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외부에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열사 간 이전을 통해 몰아놓은 건 만약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양그룹은 이에 대해 “매각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행보일 뿐 자산 빼돌리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제도 가운데 법정관리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지만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땐 채권단이 돈줄을 틀어쥐고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만 법정관리에선 대부분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을 계속 맡긴다.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도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또 지분을 담보로 잡혀 사실상 소유권을 잃는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감자를 당하더라도 일부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위기에 부닥친 건설사들이 채권단의 만류를 뿌리치고 줄줄이 법정관리를 택하고 LIG그룹과 웅진그룹 등이 법정관리 직전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한 게 문제가 돼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기존 대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앉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가 얼마나 성실하게 경영을 했는지, 채무탕감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이 중시하는 추세”라며 “동양그룹이 내놓을 회생계획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현철·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