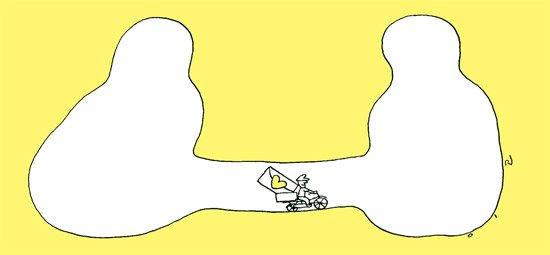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혜 민
혜 민스님
세상 모든 이가 누군가의 귀한 아이이듯, 비구 승려 역시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다. 비록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심해서 출가한 몸이라 할지라도 부모와의 천륜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는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구해낸 지극한 효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근대 한국 불교를 일으킨 경허 선사 역시 크게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한다. 경허 선사가 직접 탁발해 가며 20여 년간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하니, 깨달았다 해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주위를 보면 홀로 되신 노모를 절에서 모시고 사는 어른 스님들이나, 부모님 생신날에는 잠시 속가에 들러 가족과 함께 공양하는 도반 스님들도 보게 된다.
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속가에 며칠이라도 머물며 아들 도리를 다하지 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오랜만에 뵙는 어머님의 모습은 점점 힘없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희끗희끗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도 빠지기 시작하셨다. 할머니가 되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의 눈으로 보고 있자니 속상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세상의 만물이 다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좀 그 무상의 진리가 비켜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다소 내성적이지만 밝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신 어머니.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시고 고운 심미안을 지니신 어머니. 책을 좋아하시고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글로 옮겨놓으시는 어머니.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고 닮고자 했다.
그렇게 항상 밝고 곱고 건강하실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최근에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야 알 수 있었다. 타지에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 내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모양이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처럼 가슴 철렁한 말도 없는 것 같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 마음은 고향땅에 머물렀던 지난달 내내 어머니 주위를 맴돌았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 어머니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아팠다.
일반 대중들에게 강연할 때면 나는 항상 마지막 시간에 서로서로 손을 잡고 같이 하는 ‘마음 치유 명상’을 한다. 이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양손을 잡고 계신다고 상상하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다 같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엄마도 나와 똑같이 이 생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군요.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행복해지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부모님 몸이 건강해지시길.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어디를 가시나 항상 보호받으시길’. 그렇게 다 함께 조용히 읊조리다 보면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신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더 잘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올라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다. 나도 대중들과 함께 어머니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깊은 심원으로부터 울컥 올라오는 한마디가 있었다.
“엄마,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
머리가 아닌 가슴이 하는 말은 이처럼 간단하고 직접적이다. 좀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바로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는 이 문자를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한다. 그리고 다짐하셨다고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건강해져야지 하고 말이다. 부모는 그런 존재인 듯하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아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챙기는 존재.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 자식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다. 저자의 어느 인터뷰를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설을 구상하며 글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어머니’라는 단어를 ‘엄마’로 고쳐 쓰자 술술 써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설 마지막을 보면 큰딸이 바티칸시티에 갔을 때 성모께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껴안고 있는 피에타상 앞에 장미나무 묵주를 내려놓고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다음 주면 다시 출국한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아들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다. 속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찾게 된다.
혜민 스님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