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변수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촌의 모습. 남북한의 불빛이 대조적이다. [중앙포토]
개별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변수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촌의 모습. 남북한의 불빛이 대조적이다. [중앙포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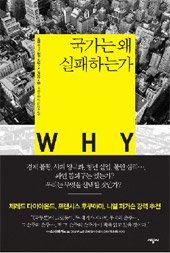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시공사
704쪽, 2만5000원
얼추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하지만 그 후 경제력은 역전됐다. 남한은 성장을 계속했고, 북한은 답보하거나 후퇴했다. 이제는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 같은 민족이니 민족성의 차이가 원인일 순 없다. 유교적 전통도 동일하니 문화적 차이도 아니다. 지하자원은 오히려 북한이 더 많다.
근본적인 차이는 제도다. 남한은 시장경제체제고, 북한은 계획경제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하지만 북한은 열심히 일해도 남보다 잘 살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격려하는 인센티브,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유무가 부국과 빈국을 가름한다. 지은이는 이걸 포용적 경제제도라 부른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사회란 의미다.
사실 이 주장은 그리 신통방통한 건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는 성장하고, 그 반대의 사회는 퇴보한다는 건 어찌 보면 상식이다. 정치제도도 마찬가지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도입·정착하는 건 정치제도의 몫이다. 특권층의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 다른 계층의 이익을 몽땅 앗아가는 정치제도에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적 권력이 골고루 배분돼있는 정치제도를 가지면 된다. 민주주의 얘기다. 또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지고 그 결과물은 사유재산권으로 보장해주는 경제제도를 만들면 된다. 요약하면 민주적 시장경제다. 어떤 나라가 왜 못사는지를 분석하는 비결도 간단하다. 이 책의 제목대로 실패하는 국가는 특권층의 이익만 챙기는 착취적 정치제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을 수탈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부국과 빈국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제도의 차이라는 주장이야 새삼스럽지 않다. 제도경제학자나 경제사학자들의 주장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동서고금의 역사를 넘나들며 얼마나 많은 사료를 들이대느냐 하는 점이다.
이 책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로마제국의 역사에서 시작해 현대까지 내려온다. 남미에서 시작해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검증한다. 강점은 또 있다.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큰 강점이지 싶다. 역사를 단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사엔 필연만 있는 게 아니며, 때로는 우연이 더 중요한 경우도 허다하다. 남한이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고, 북한이 착취적 제도를 받아들인 건 따지고 보면 우연이다.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구(舊)소련이 점령군이었기 때문이다.
그 반대였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됐을 거다. 미국과 남미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페인이, 페루를 영국이 식민지화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크게 달랐을 수 있다. 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해도 만일 미국에 잉카제국 같은 거대 문명이 버티고 있었다면 역시 오늘날의 미국이 되지 못했을지 모른다. 똑같은 영국 식민지였는데도 미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이 달랐던 건 이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제도만 억지로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어색하지 않다. 남미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식했는데도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막대한 원조를 받았는데도 아프리카의 일반 국민의 삶은 왜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지,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근대화 이론이 왜 잘못됐는지, 이 책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단독] 용산 "檢인사 예고됐었다…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bc0f127f-1f06-4b32-a56b-7c5e2197165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