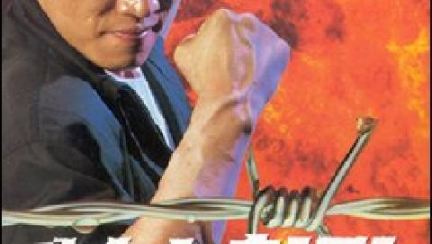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정부가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해선 안된다. 연구소·기업·금융 간 협업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핀란드경제연구소(ETLA)의 로라 파이야(사진)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 노키아 등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자 정부는 이공계 대학 정원을 두배로 늘려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재자·보조자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TLA는 핀란드 정부의 용역을 받아 1993년 '국가산업전략 백서'를 발간, '지식경제 중심의 클러스터 산업구조'라는 기반을 닦은 두뇌집단이다. 90년대 들어 핀란드는 러시아 시장 붕괴와 수출감소, 은행부실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때 ETLA는 세계 2위의 임업국가인 핀란드의 산업구조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 5백10만명의 작은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클러스터별로 분배하면서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협력채널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기술은 공유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협업하도록 했다."
당시 핀란드 정부는 기술개발센터(TEKES)를 만들어 민간과의 공동연구를 관리·감독했다.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세계 2위 수준인 3.1%대로 뛰어오른 것은 사실상 이 덕분이다. 대학교의 40%, 연구소의 25%가 산학협동 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80년대까지만 해도 비중이 미미했던 휴대전화·교환기 등 정보기술(IT)제품의 수출비중이 최근에는 30%대로 성장, 제지·펄프를 제치고 1위로 부상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외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졌다.
"외국 기업이 핀란드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것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때문이다. 고급정보와 인력을 얻을 수 있고, 앞선 기술과 생산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국가별로 경제환경이나 정책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클러스터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국처럼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처한 작은 나라들은 클러스터 시스템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