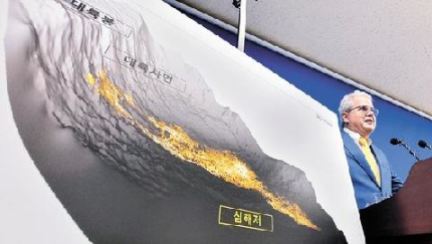먼저 조 편성 얘기다. 대회를 이틀 앞둔 7일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을 때다. 그가 있던 14번 홀로 조직위에서 찾아왔다. “타이거 우즈와 같은 조에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했다. “우즈와 같이 게임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에요. 타이거는 시합하는 리듬이 좋아요. 공 치는 것도 보통 선수들하고 다르고, 시간도 질질 끌지 않죠. 주눅이 드는 선수도 있지만 난 그런 선수와 치면 성적이 더 잘 납니다. 갤러리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요. 배울 것이 많은 선수죠.” 걱정은 되지 않았을까. ‘우즈와 함께 경기하는 것은 마취를 안 하고 수술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한 사람도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걱정은 됐죠. 좀 시끄럽겠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 편성에 대해 허락을 받는 일도 놀라웠다고 했다.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골프 대회에서 상대가 누구인데 괜찮은지 허락을 맡는 일은 없죠. 그냥 인쇄해서 뿌려 버리죠. 그런데 그 룰을 깰 만큼 조직위가 신경을 썼나 봐요.”
최경주는 “우즈 자신도 편하고, 상대도 피해를 보지 않을 선수로 나를 고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나를 우즈가 요청했거나, 조직위가 우즈에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를 응원한 한국 팬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4라운드 13번 홀이었다. 최경주는 3라운드까지 매번 버디를 잡은 이 홀에서 보기를 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 최경주는 “13번 홀의 버디와 보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다. “그린 뒤에 있는 벙커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이 한두 번 정도 튀었으면 내리막을 타고 홀 부근으로 굴러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뿐이죠. 오거스타 그린이 워낙 빠르고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에 가깝게 공을 떨궜다면 물에 빠졌을 겁니다. 오거스타 그린은 다른 곳보다 3배 정도 정교한 샷이 필요해요.”
마지막 홀 그린으로 걸어나오면서 그는 우즈와 오랜 친구처럼 손을 잡고 잠시 얘기했다. “나흘 동안 정말 잘 쳤다. God bless you, I like you(신의 은총을 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영어로 말했죠. 고마워하더군요.”
최경주는 이 홀에서 어프로치샷이 짧았는데 우즈가 칩샷이 들어가라고 응원을 해줬다고 했다. “나흘 동안 함께 경기한 내가 막판까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중 냉정한) 우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전과 달라졌고 나에 대해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호준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