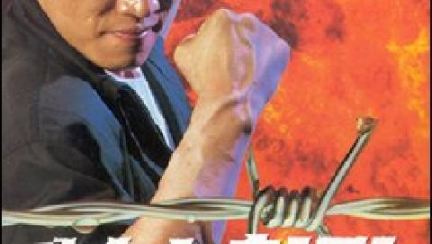과연 아시아적 의미의 독자적인 근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가?
이것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적 근대를 지배해왔던 서구중심주의의 시각을 벗어나 자생적 근대화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학자들이 부딪힌 가장 곤혹스러운 물음이었다.
특히 개인의 삶보다 집단의 규범을 중시하고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를 강조하며 미래보다 과거를 숭상하는 유교의 논리는 동아시아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근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룻소로 불리는 황종희의 '명이대방록' (明夷待訪錄)은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유교적 지식인이 지녔던 개혁에 대한 요구와 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명말청초의 혼란한 시대에 명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던 저자가 사라져가는 명나라의 암울한 운명을 지켜보면서 쓴 것이라고 한다.
'군주론' '관리선발' '수도건설' '토지제도' 등 이상적인 국가 운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이 책의 내용들 속에는 명의 몰락을 가져온 국가운영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은 군주뿐이다.
이전에 군주가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사(自私)와 자리(自利)를 얻을 수 있었다.
아아! 어찌 군주를 둔 것이 본래 이와 같았겠는가!"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군주를 부정하는 이러한 논리는 유교의 최고덕목이 충과 효임을 상기한다면 그 혁신성의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황종희에게 진정한 충의 대상은 군주 개인이 아니라 천하 백성인 것이다. 군주 역시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이 개인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던 청말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民)에 기초한 정치철학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바탕을 백성에게서 찾고 있는 그 개혁적 발상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국가운용의 기본틀은 여전히 유교적 정치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되풀이해서 삼대(三代)로 일컬어지는 중국 고대의 하(夏).은(殷).주(周)시대로 돌아간다.
이 책의 제목인 '명이' 는 암울한 명나라 말기의 상황을, '대방록' 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을 의미한다지만, 저자가 갈망한 것은 기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복원, 즉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실현이었다.
동아시아적 근대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개혁적 유학자의 이러한 한계를 끌어안는 지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