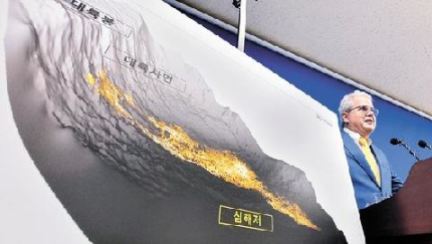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 정현종 약력
▶39년 서울출생 ▶65년 '현대문학' 으로 등단 ▶현 연대 국문과교수 ▶시집 '사물의 꿈'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등 ▶네루다시선.로르카시선.예이츠시선 등 번역
비 갠 지 한참 지난 마른 하늘인데도 가로수 아래를 걷다 보면 물방울이 툭, 투두둑 떨어진다.
무성한 잎잎에 피어 있던 빗물이 바람결에 떨어진 것이겠지만, 드높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눈길을 나무로 낮추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푸른 존재를 향해 묻곤 한다.
"응?…뭐라고?" 시인이란 삼라만상의 기미에 귀기울이는 자들. 시집 '갈증이며 샘물인' 에도 그런 순간이 그려져 있다. ( "나무에서 물방울이/내 얼굴에 떨어졌다/" ) 그러나 "나무가 말을 거는 것이다/나는 미소로 대답하며 지나간다" (시 '물방울 - 말' 에서) 라고 이어지는 싯귀에서 이 시인의 격조가 나같은 시인의 걸음으로는 쉬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임을 느낀다.
미소로 대답하며, 지나가다니!
의자에 기대어 앉았던 몸을 일으키면서 잠깐 내 마음은 턱을 괸다.
문득 시집 밖의 사석에서는 시인의 미소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인은, 웃는다면 크게 웃는다.
왕의 웃음이 그렇지 싶게, 천하에 오종종히 떠있는 구름과 근심이 쏙 벗겨지도록 거침없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나무에 던진 '미소' 라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대답일 것인가.
그 웃음이 크듯 정현종 시의 이미지는 크다.
아침 햇빛 한 줄기에서 태초와 미래의 생명들을 만나고 - "아침 햇빛이여/아직 밝지 않은 날들이 수없이 많고나/싱싱한 태초 - 새 날이여. /내 속에 들어 있는 아이들을/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 없는 아이들을 여지없이 떠오르게 하는구나" (시 '아침 햇빛 2' 에서) ,
꽃잎 한 장으로 궁궐을 만든다 - "저 선홍색 꽃잎들!/시멘트 바닥이 홀연히/떠오른다. 무가내하/떠오르고 떠오른다. /또한 방은 금방 궁궐이 되느니" (시 '꽃잎 2' 에서) .
이런 시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지리멸렬한 것이 아니라고 깨우친다.
'갈증이며 샘물인' 을 비롯한 정현종의 시집들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의 크기와 넓이를 넘어 나무와 꽃과 새와 같은 자연으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주문이 가득하다.
"새여/너는 사람의 말을 넘어/거기까지 갔고/꽃이여/너는 사람의 움직임을 넘어/거기까지 갔으니//그럴 때 나는/항상 조용하다/너희에 대한 찬탄을/너희의 깊은 둘레를/나는 조용하고 조용하다" (시 '새여 꽃이여' 에서)
이상희 <시인>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