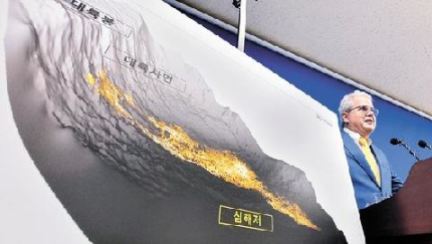제1장 슬픈 아침 ⑧
참담한 노릇은 정작 불러 볼 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적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있을 턱이 없는 한계령 깊은 계곡에서 도깨비처럼 휘젓고 달리며 혼자 불러야 할 노래. 울창한 숲속에 숨어 있는 짐승들이나 들어줄 노래였으므로 구태여 목청을 가다듬을 필요도 없었고, 노랫말 따위를 가릴 경황도 건더기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카페의 무대로 올라선 가수처럼 무슨 노래를 부를까 속으로 고심한 것이었다.
초조하고 곤혹스러웠지만,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자신에겐 혼자 부를 노래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심장의 내벽에 자욱하게 끼어 있는 짙은 어둠 때문일까. 쥐어짜듯 가까스로 떠올린 노래가 애국가의 일절 가사였다.
그는 애국가 일절만을 수십 번이나 연거푸 부른 애국자가 되어 드디어 한계령 정상에 도착했다.
누가 지금의 자신을 숨어서 바라보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가소롭고 참혹해 보였을까. 휴게소가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담배를 피워 물고 보니,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난 초저녁, 서울의 집을 나설 때보다 더욱 큰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박봉환이란 엉뚱한 자를 놓치고 난 뒤, 애국가를 부르며 여기까지 헉헉거리고 달려온 40여분 동안의 자기 모습은 한 토막의 코미디 외엔 다른 아무 것도 아니었다.
드디어 눈가장자리로 눈물이 배어났다.
그러나 눈물을 얼른 소매로 닦아냈다.
휴게소에서 흘러나온 고즈넉한 불빛이 그가 앉아 있는 길바닥 앞까지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대여섯을 헤아리는 자동차들이 주차하고 있었다.
물론 푸른색 물탱크를 장착한 박봉환의 용달차도 눈에 띄었다.
그는 야간에도 영업중인 휴게소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탁 하나를 차지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박봉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박봉환이 먼저 그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인제사 오시네요. 여기까지 올 동안 노래연습 많이 했지요?" 여기까지 뛰어올 동안 주먹까지 부르쥐었던 적의보다 실소가 먼저 튀어나왔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위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누리는 삶의 표피에는 대담성은 있었지만, 곰삭은 긴장감은 묻어나지 않았다.
길바닥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내의 꼭두각시 놀음에 놀아났던 40여분이 수치스러울 뿐이었다.
그와 드잡이를 하고 다툰다는 것은 그로서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는 박봉환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형님,땀 많이 흘렸지요? 형님을 그냥 두면, 땅 속으로 가라앉을 사람 같길래 땀 좀 흘려 보라고 한 짓입니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이소. 해장국 주문 해놨으니 곧 내올 낍니더. 먹고 슬슬 내려가보시더. " "의도가 거기 있었다면, 왜 먼저 말하지 않았소?" "먼저 말하면, 휴게소에서 다시 만나도 재미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껴?" "내가 위축되고 허탈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조롱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격의 없는 사이는 아니지 않소. " "앗따. 그렇게 정색하고 나오시면, 내가 무안하지 않습니껴. 웃고 치우소. 길바닥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잠시 동안에도 경험했을 테니, 인제 댁으로 돌아갈 생각이 간절하겠지요?" "지금 날 훈육하는 거요?" "안개가 걷히네요. " 박봉환은 딴전을 피우며 턱짓으로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 해장국 두 그릇이 식탁으로 배달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었다.
한철규는 문득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애틋하게 살아있음이 소중했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