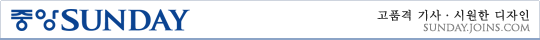지난해 8월 한국에 부임한 렌젤 미클로시 헝가리 대사는 지난 일요일 한·헝가리 친선협회에서 즉석 연설을 요청받았다. 미클로시 대사는 속담을 섞어가며 한국어로 연설해 분위기를 돋웠다. 1주일에 한 번씩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어 특훈’을 한 덕분이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주한 헝가리대사관. 한국어 선생님 김효영(21·서울대 경제학부2)양이 미클로시 대사에게 준비해 온 교재를 건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신문기사다.
“정,부,조,직, 십삼 부, 이 처로….”
신동연 기자
왜 부는 십삼으로 읽고, 명은 열하나로 읽느냐고 대사가 질문한다. 사람은 한 명, 두 명으로 센다고 효영양이 설명했지만, “시간은 십일분이잖아요…”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떤 때는 한국 숫자(하나, 둘…)로 하고, 어떤 때는 중국 숫자(일, 이…)로 하는지 다음 시간에 정리해 주세요.”
효영양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영어로 설명을 계속하자 “잠깐만, 잠깐만, 한국말로 please”라며 미클로시 대사가 말린다. 한마디라도 더 한국어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미클로시 대사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을 다닐 때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 1985~89년 평양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90년 처음 한국에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웃는다. 북한 사투리를 고치려 많이 노력했다고 한다. ‘안됐습니다’(미안합니다), ‘조선어’(한국어) 등 사용하는 단어도 일부 달랐지만, 무엇보다 북한에는 없는 시장경제와 관련된 단어를 익히는 것이 힘들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미클로시 대사가 따로 과외를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무원 7000명 감축?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통일부 폐지 문제, 공무원 감축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어 수업은 늘 이렇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토론으로 끝난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감정 문제를 얘기했다.
“저한테 효영씨는 단지 한국어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속내를 들려주는, 한국을 향해 열린 ‘창(窓)’과 같아요.”
미클로시 대사와 효영양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외교사절단’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다.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지만 업무에 쫓기고 마땅한 선생님을 찾지 못하는 외교관들을 구청이 자원봉사 학생과 1대1로 연결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콩고 등 13개국 외교관 23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슬로바키아 부대사의 경우는 아들 유라이(20)에게 자신의 선생님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제가 주한 브라질대사관에서 9년 동안 근무했는데 브라질 외교관 가운데 어려운 한국어 때문에 부임을 꺼리고, 부임한 뒤에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강남구청 백은경 사회복지사의 말이다. 그는 “뒤늦게 신청해오는 외교관이 많아 다음달 자원봉사할 대학생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