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업 개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FTA라는 큰 판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을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제 "교육.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률.회계 분야도 일부만 개방됐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막강한 기득권층이 버티는 분야는 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당초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가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과감히 개방해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었다. 아울러 일자리도 늘려볼 심산이었다. 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67만 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10배에 달하는 640만 개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협상 초기만 해도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논의에서 빠지더니 결국 이런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
미국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다. 미국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경쟁도 해보기 전에 문단속부터 한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료의 공공성이 강해 개방을 유보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은 자국 내 한국 유학생이 넘쳐나는데, 굳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골치 아픈 쟁점이 많은 양국은 교육.의료는 덮고 가기로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 서비스업에 관한 한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안이하게 협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설령 미국이 미적거려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
서비스업 개방이 유보되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한.미 FTA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50만 명에서 30만~40만 명, 생산 증가율은 7% 안팎에서 5%로 낮아질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서비스업은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달러에 달했다. 해외 유학.연수생이 10만 명을 넘었고, 45억 달러를 썼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때도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 개방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태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몰리고 있다.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선진국이 된다. 국민의 불만이 비등한데, 언제까지 공공성만 강조하면서 울타리를 쳐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전교조.의료단체 등 기득권층의 반발을 물리칠 각오부터 다지기를 바란다. 그게 안 되면 유학이나 병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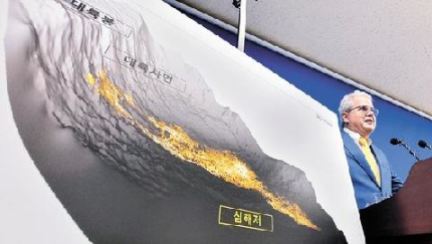
![[속보] 푸틴·김정은 회담 시작…국방·외교 참모진 대거 동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e1c52a77-fca5-46fb-a6d7-d6243489746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