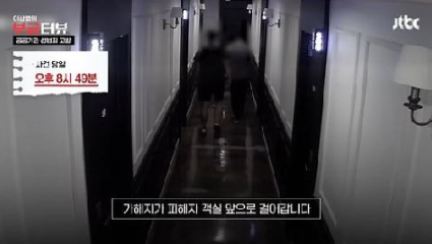[더,오래] 조용수의 코드클리어(43)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다. 눈 한번 제대로 내리지 않았던. 하지만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었다. 눈을 대신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내렸다. 얼어붙은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응급실 외부에 조그만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했다. 급하게 마련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였다. 아직은 날씨가 추웠다. 새벽이면 가건물의 헐거운 벽을 뚫고 한기가 스며들었다. 등이 시렸다. 환자는 쉬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에겐 코로나19가 살을 에는 추위보다 무서운 게 틀림없다.
동틀 무렵 초로의 여자가 선별 진료소 문을 두드렸다. 마스크 위로 불안에 가득 찬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파서 찾은 병원이건만 그녀는 죄인처럼 웅크렸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이나 뜸을 들이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는데 집에만 있었다고,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 같다고 했다. 어제부터는 음식 넘길 기운조차 없다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새벽에 겁이 더럭 났다고, 남은 힘을 쥐어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동틀 무렵 초로의 여자가 선별 진료소 문을 두드렸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는데 집에만 있었다고,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 같다고 했다. [사진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6/61609541-ab7e-4ee7-87ec-3249f632d332.jpg)
동틀 무렵 초로의 여자가 선별 진료소 문을 두드렸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는데 집에만 있었다고,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 같다고 했다. [사진 뉴시스]
환자의 귀에 체온계를 가져갔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삐삐거리는 소리와 함께 39도 넘는 고열이 측정됐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에게 매달렸다.
“저는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에요. 종교도 없고 어디 다녀온 곳도 없어요. 그냥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 같아요. 제발 내쫓지 말고 치료해 주세요.”
이미 여러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터였다. 1주일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고열 때문에 봐주는 병원이 없었다. 계속 열나는 게 수상하다고, 아직 코로나19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다른 환자에 옮길지 모른다고 병원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았단다. 평소에 지병도 있고 먹는 약도 많다면서, 제발 링거 한대만 놓아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다들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고 했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린 거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든 입원시켜서 치료해줄 테니까요.”
![코로나19는 온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련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버려지고 소외된 많은 환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사진 Pixabay]](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6/0b228099-7172-4d1c-9d67-c2c076bd7cbe.jpg)
코로나19는 온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련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버려지고 소외된 많은 환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사진 Pixabay]
그렇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격리해 전파를 막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을지, 모든 관심과 정책은 오직 코로나19에만 집중되어 있다. 물론 코로나19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온 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련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버려지고 소외된 많은 환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사정이 안타까웠다. 가급적 진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 하지만 격리실에 빈자리가 없었다. 먼저 온 환자들이 방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일반 자리에서 진료할 수도 없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면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테니.
일단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점심쯤 결과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진료를 봐줄 테니, 그동안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환자였다. 본인 부담금 십수만 원을 한 번 더 내고 검사를 받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 설령 검사를 받더라도, 당장 병실을 배정받고 링거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그녀는 옷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올게요.”
그녀의 자조 섞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 얼마나 많은 환자의 눈물이 남게 될지. 4월이 되었건만,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 유난히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theore_creator@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5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세상에 홀로 나간지 8년…27세 예나씨의 쓸쓸한 죽음 [소외된 자립청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be204767-01c0-4ae6-bbc9-1c6fb4ac3bb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서울 근무 중 첫사랑과 재혼…이렇게 좋은 한국, 딱 하나 아쉬워" [시크릿 대사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5a6917ad-45ac-49fa-8d19-85b695682267.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