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회의 소통은 주거 기반 소통(home-based communication), 즉 가족·이웃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은 대중 간 텍스트가 넘쳐나는 가운데 이웃 공동체 속 대화는 줄고 있다. 문자와 이미지에 의존한 간접 소통은 일상이 됐지만 면대면 직접 소통은 생소해졌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불통과 불신의 원인이 됐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Slavoj Žižek)는 이웃을 얼굴 없는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정을 나누기는커녕 살인과 폭력 뉴스의 주인공이 된 현실에서 이웃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됐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Kierkegaard)도 이웃을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웃이 이기적 애정 표현의 대상이란 의미다. 따라서 이웃 간 소통은 ‘자기애’를 실천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중적 성격의 실천이다. 그래서일까. 올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대·가족·이웃 간 이해와 화해를 위한 소통사업으로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문적 소양 확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사업에 투자될 한 해 예산만 274억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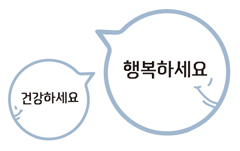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것 말고 당장 작은 실천 하나라도 복원시키면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문 소양을 자극한다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불통 속 이기적 주장만 넘쳐나는 시대에 인문학을 교육시켜 소통을 복원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대화가 단절된 공간에 유치원 수준의 기본 대화만이라도 복원시키는 것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것은 절제된 이웃 간 소통, 즉 최소한의 인사말 나눔이다.
이웃 간 불통을 해결하고 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인사말이다. 이 작은 인사말이 절실한 공간을 지금까지 침묵이 지배해 왔다. 그 공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다. 공동체 내 침묵은 사회문제로 발전하며 시민의 생성을 무력화시켰다.
작은 외침 LOUD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소통 촉진자로 창의적 특징물(character·캐릭터)을 고안했다. 특징물 개발 과정에선 일상을 지배하는 메신저 앱의 상징인 ‘말풍선’에 주목했다. 유명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특징물 명칭은 ‘인사말 풍선’이다. 엘리베이터라는 폐쇄 공간 속 시선이 가는 곳엔 어김없이 인사말 풍선으로 적합한 말을 제시했다. 더도 덜도 말고 인사말로 자기애를 경험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중앙SUNDAY 콜라보레이터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