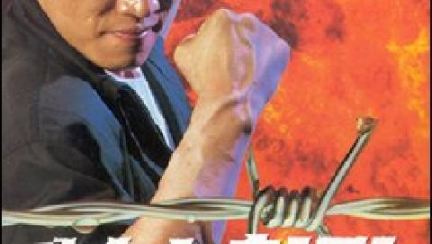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고질화된 일부 부정·부패와 노사대립으로 조장된 상호간의 불신풍조는 어려운 문제 중에도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우리 주위의 모든 부조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정당국의 시급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그 병근을 따져보면 결국 국가민족과 공중사회를 생각하기에 앞서 개인본위의 뿌리깊은 이기심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인생활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누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만은 참다운 행복과 자유는 철저한 이기주의 위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나는 「오관쟁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를 하루 세끼 먹여 살리는 구실을 하는 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코가 오만하게 저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을 크게 불평했다.
이 불평을 받은 코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숨쉬는 구실을 하는데 참으로 하는 일없는 두 눈이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오관쟁위」의 현실화>
두 눈이 불평을 받고 생각하니 자기는 보는 구실을 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눈썹이 제 위에 있는 것에 항의를 했다.
이때 눈썹은 대답 할 말이 없어 입 아래 제일 낮은 끝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세상 사람들은 눈썹 없는 큰 병자라 하여 상대를 아니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코·입은 다시 상의하여 눈썹을 제자리에 모시고 서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다.
<나는 어디서 왔나>
우스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가?
「나」라고 하는 것이 6척 미만의 작은 체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왔는가? 조부모에서 태어났다. 또 그 조부모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대로 관련된 많은 부모의 수효는 등비급수로 불어나가 무한수에 이르게 된다. 즉 「나」라는 개체적 존재가 무한한 생명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 개체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우리는 곡식과 채소·육류 등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여 간다.
그 뿐인가? 물을 마시고 태양의 광선을 쬐며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무한한 공간과 생명을 하나로 하고 사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 역사와 사회를 통하여 일체의 것과 생명을 같이 할 때 비로소 「나」라는 개체가 있게 된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무한의 생명, 무한의 공간과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사은이라고 한다.
우리는 개인의 「나」가 아니라 자주 인생가운데 「나」, 또 다시 말하면 무량한 사은의 은혜가운데 살고 있는「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의 「나」가 아니라 사은의 공변된 「나」요, 나의 소유물도 사은의 공변된 물건이다.
<네 가지 은혜 갚는 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이러한 사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중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나의 사 없는 정성과 능력을 다하고 창의와 노력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하고 능률을 올려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인 동시에 국가사회에 봉공하는 길이며 나아가 사은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하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서로 장벽을 쌓고 국가 사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현상을 자아내고 있는 이 부조리를 바로 잡고 자주 인생의 당연한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여 바르게 살며 각자 개인과 가정에 참다운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를 찾아 새롭게 살아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