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치권에 ‘한국식 교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웨덴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복지의 근간으로 삼아온 유럽의 대표적 교육 강국이다.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6% 이상(2008년 기준)을 교육 예산으로 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공공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고, 성평등·민주주의 교육도 철저하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립학교를 골라도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 ‘교육 천국’ 스웨덴에서도 교육 경쟁력 약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학 능력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기업에선 숙련된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러다가 한국식 교육까지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정부 교육 지출은 4.8%(2010년 기준)에 달하지만 개인이 GDP의 2.8%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
야당 대표 “한국, 교육에 대대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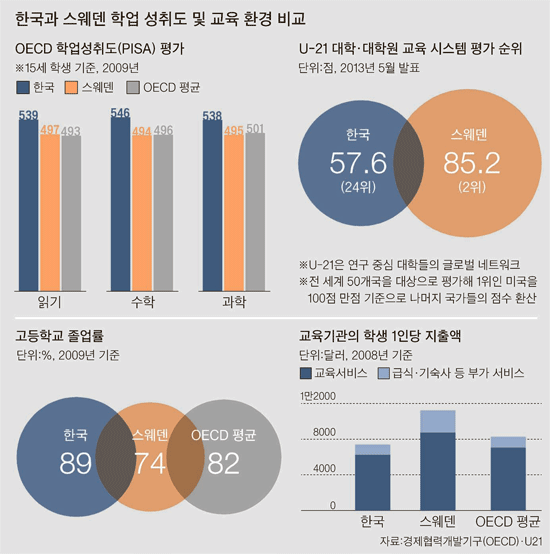
한국식 교육 논쟁은 스웨덴 제1 야당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스테판 뢰프벤(56)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스웨덴 일간지 더겐스 인듀스트리(DI)에 “스웨덴은 한국을 모방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뢰프벤 대표는 “스웨덴 교육 경쟁력이 앞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한국이 어떻게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배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스웨덴에선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학교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한국 대학을 방문해 고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교육 수준은 매년 5%씩 성장했지만 스웨덴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목표치가 높고,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한국 특유의 교육열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교육을 받는 인구 비율이 스웨덴을 앞질렀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도 기업에선 숙련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스웨덴에선 향후 10년간 2년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의 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장관 “고등교육 질 스웨덴이 높아”
뢰프벤 대표의 주장은 스웨덴 사회에서 논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화와 풍토가 전혀 다른 한국의 교육을 모방하는 것이 과연 스웨덴의 교육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주당 60시간씩 공부하는 한국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교육 수장인 얀 비외르크룬드(51)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뢰프벤 대표 기고문 발표 2일 후 같은 일간지에 “한국은 롤모델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내 뢰프벤의 글을 ‘숫자를 이용한 사기’로 몰아붙였다.
비외르크룬드 장관은 스웨덴 고학력자가 줄어드는 것은 특정 시점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붐이 일어난 2003년 성인이 돼 바로 취직한 사람이 많은 30~34세 연령대의 고학력자 비율 감소만을 악의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을 고등교육의 모델로 들었지만 OECD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 대학에 개설된 강좌 중 3분의 1은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U-21 순위에서 스웨덴이 한국을 앞선다는 점도 제시했다. U-21 순위는 대학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우니베르시타스 21’이 50여 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평가해 매긴 순위다. 이 순위에서 스웨덴은 미국 다음인 2위로 평가됐지만 한국은 24위였다.
스웨덴 정치권이 이처럼 한국 교육 논쟁에 골몰하는 이유는 3년마다 발표되는 OECD 학업성취지수(PISA) 발표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PISA는 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다. 이번 평가에서도 스웨덴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일 전망했다.
OECD 내달 3일 학업성취지수 발표
2000년대 선두 그룹이었던 스웨덴의 성적은 2009년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은 1~2위를 다툰다. 2006년 집권한 현 중도우파 정부는 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임금인상 프로그램 등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었고 다른 교육 지표도 하락세라 현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비외르크룬드 장관도 이 점은 인정한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에 “우리가 집권 이후 시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뿐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중 한국을 참고하는 경우가 늘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명한 한국 교육 예찬론자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면서 기초 지식 습득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식 습득 효율이 높은 한국식 교육이 주목 받는 것이다. 물론 ‘한국식 교육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6일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던 교육열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영선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